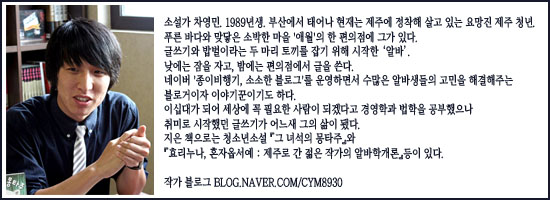횃불이 스친 곳마다 피비린내가 울부짖었다. 비명과 함께 땅이 진동하더니 조금 전 보았던 기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주변을 뒤흔들었다. 쇠가 부딪치는 소리와 비명은 점차 줄어들었으나 단 한 사람, 대장의 목소리만큼은 오히려 밤하늘에 덮인 적막함을 산산조각냈다. 그와 함께했던 동료 군사들은 모두 바닥에 얼굴을 바짝 붙였지만 그는 날아드는 화살과 창을 걷어내며 오히려 둘러싸는 군사들에게 먼저 달려들기도 했다.
“몬딱 붙으라!”
기마병을 주축으로 그를 완전히 에워싸며 활동범위를 줄여나갔다. 뒤에서 궁수들은 활시위를 당긴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와중에 쓰러진 우리 쪽 군사들 중 몇몇이 살짝 움직임을 드러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의 군사들이 귀신처럼 달려들고 발길질과 칼까지 휘둘러 잠재웠다.
어느새 그의 점점 거칠어지는 호흡이 기합보다 더 커졌다. 기마병들은 점점 그의 그림자를 완전히 가렸다. 딱 한 번 벼락이 내리치듯 강하게 쇳소리가 울리고 순간적으로 적막함이 그곳을 뒤덮었다.
노인은 손으로 내 입을 막은 채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다. 내가 계속 눈짓을 했으나 오히려 입과 코를 더 바짝 눌러댔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건 바로 앞에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기 때문. 불빛이 비치지 않아서 얼굴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군사들이 시선이 모두 대장을 향해 있고 그림자와 거리는 어림잡아 대여섯 발자국 정도였다. 노인은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팔을 붙었다. 그러나 도저히 나를 향해 뻗은 손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깨로 힘껏 노인을 밀어내고 숨어있던 문 뒤편 틈새에서 빠져나왔다. 조심스럽게 몇 발자국 나아가서 내게 뻗은 그 손을 붙잡고 어깨에 걸치게 한 뒤 조금씩 일으켜 세웠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온통 흙과 피로 범벅이었지만 숨은 미력하게나마 계속 내쉬었다. 무엇보다 내가 짐작했던 바로 지슬이 확실했다.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신음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으나 제대로 들리진 않았다.
살며시 뒤돌아보니 여전히 군사들은 대장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노인은 문틈 사이에서 말없이 얼른 들어오라고 손짓만 바쁘게 해댔다. 지슬의 팔을 어깨에 다시 제대로 걸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던 순간, 내 앞에 낯선 그림자들이 가로막았다. 그중 한 사람이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발로 배를 걷어찼다. 지슬과 잡은 손을 놓치면서 바닥에 네댓 번 구르다가 겨우 멈췄다. 그것도 잠시 몇몇이 달려들어서 내 몸 구석구석,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발길질을 퍼부었다.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아서 제발 멈춰달라는 말이 좀처럼 목구멍을 벗어나질 못했다.
“멈추라!”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별이 쏟아지려고 할 때, 노인의 목소리가 내 귀에 스며들었다. 순식간에 내 몸에 깊이 파고들던 발길질이 멈추었다. 노인은 제 몸을 탈탈 털어내면서 다가오더니 나를 직접 일으켜 세웠다.
“영 모사불민 됨시냐, 솔솔 허주.”
노인이 혀를 차자, 분명 눈을 뒤집고 발길질하던 자들이 모두 고개를 푹 숙였다. 지슬은 그들에게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나와서 말려줄 것이지! 그사이 대장은 얼굴부터 온몸이 피범벅 상태로 군사들에게 포박당하여 노인 앞으로 끌려왔다. 기마병들은 노인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와 깍듯이 예를 갖추었다.
“어떵 나신디 영 헐 수 이서 마씸?”
대장은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게거품까지 물며 달려들려고 했다. 그를 붙들던 군사들이 창대와 발길질로 기어이 기절시키고 말았다. 노인은 눈치를 살피며 헛기침만 연신 내뱉었다. 곧이어 성주청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다름 아닌 성주와 왕자, 그를 호위하는 군사들이었다. 난 얼른 고개를 숙이고 다리가 풀린 척하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러나 노인은 물론이고 곁에 있던 두 명의 군사들도 나를 잡아주는 시늉마저 하지 않았다. 결국 얼굴을 바닥에 정면으로 들이박은 채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냉기와 피비린내를 잔뜩 묻혔다. 누구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딱히 일어나서도 안 될 상황이긴 했다.
“덕분에 역당을 완전히 소탕했구려! 다 장군, 그대의 덕이오. 내 절대 잊지 않으리다.”
“전하, 무신 장군이랜 고람수과. 민망헙니다.”
“그동안 그대의 충심에 무심했던 걸 용서하게나.”
“소인은 전하를 위해서 헐 뿐이우다.”
노인은 곧장 성주를 향해 큰절을 올렸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땐 입꼬리를 씩 올리며 한쪽 눈을 찡긋거렸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묻고 싶었으나 성주의 그림자가 내 쪽으로 향했다. 헛기침하며 내 앞에 서 있던 성주는 말없이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 난 다시 얼굴을 흙바닥에 파묻은 채 숨도 꾹 참아내었다. 곁에 있던 군사들이 무어라 말했지만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성주가 성주청 안으로 들어가자, 군사들은 대장과 맞서 싸웠던 자들을 하나둘씩 끌고 따라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직 신음이나 무슨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자들은 성주청 안으로, 아예 미동도 없는 자들은 우리가 들어왔던 길로. 지슬은 대장 바로 다음으로 끌려가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저 숨만 겨우 내뱉을 뿐이었다. 성주와 그 일행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내 곁에 있던 군사들이 팔을 붙잡더니 줄로 묶으려고 했다. 몸부림으로 버텼다가 뒤통수에 커다란 혹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가이 내불라, 내가 무신 거 시킬 일 이서부난.”
노인의 한마디에 군사들이 내 팔을 놓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문 앞엔 나와 노인만이 마주 보며 서 있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노인은 내 얼굴과 어깨에 묻은 흙을 털어줬다.
“지꺼지지 않암시냐?”
갑자기 노인은 앞니를 드러내며 박장대소하더니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왜 이러냐고 물어도 좀처럼 웃음을 멈추지 않으니 내 미간에 힘이 절로 들어갔다. 지금 우리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모두 목숨을 장담할 수 없고, 대장은 더더욱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둘만 그나마 멀쩡한 상태로 서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언성을 높였다.
“무사 경 부에남시냐? 느영나영 영 살암신디.”노인이 계속 말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달빛이 번쩍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핏자국이 흥건한 바닥 옆에 아직 회수해가지 않은 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대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눈앞에서 끌려간 지슬만큼은 빼내야만 했다. 그가 늘 내게 무사라고 해준 이상, 지금만큼은 진짜 무사의 기개를 보여주고만 싶었다. 노인에게 당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덕담을 남기고 먼저 성주청 쪽으로 향했다. 딱 한 걸음만 내디딘 그 순간, 내 옆구리에 묵직한 것이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노인이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주먹으로 찌르는 중이었다. 입꼬리는 여전히 올린 상태였지만 눈꼬리를 날카롭게 세운 상태로 나와 눈을 마주 보았다.
“전에 말 안 허연? 내가 누게 신하인지.”
노인은 내 손에서 검을 낚아채어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렸다. 자신의 주군은 분명 지금 왕궁에 있는 전하라고 밝힌 건 어찌 기억 못 하겠는가. 노인은 성주청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더니 주먹으로 한 번 더 내 배를 깊숙하게 찔렀다. 나를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한 뒤, 귓속말로 생각해뒀던 계획을 남겨놓았다.
되물을 새도 없이 안에서 나온 자들이 내게 달려들었다. 살펴보니 좀 전에 나를 묶으려고 했던 군사들이었다. 노인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해도 오히려 내 두 팔은 그들의 손에 단단히 묶였다. 오히려 뒤따라 나온 다른 군사들이 노인에게도 달려들더니 함께 포박하고 말았다. 흔들리는 동공으로 나를 쳐다보던 노인은 까만 복면까지 덮어쓴 채 먼저 끌려 들어갔다. 나도 뒤따라 끌려갔는데 몇 발자국 들어서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노인은 오른쪽으로 난 왼쪽으로 들어갔고, 가는 중에는 낯설지 않은 건물들이 보였고 흙바닥도 어느새 판판한 돌로 바뀌었다.
내가 멈춘 곳엔 면복 차림으로 바꿔 입은 성주가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내게 죽음을 선언했던 신하도 함께였다. 성주는 나를 보자마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였다. 심지어 그 신하도 포함해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올려다보는 내게 다가오더니 직접 포박까지 풀어줬다. 나와 마주 보고 쪼그려 앉더니 코웃음과 함께 혀를 찼다.
“내가 정녕 알아보지 못 한 줄 알았더냐?”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는 고갯짓과 함께 한숨을 깊게 내뱉었다. 저 멀리서 군사 한 명이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내 눈치를 살피며 성주에게 귓속말을 남긴 뒤 되돌아갔다. 얼굴빛을 검게 물든 성주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아무래도 네놈은 아직 살아야 할 운명이로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