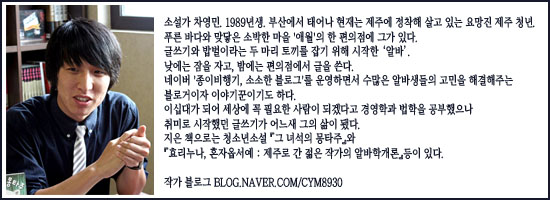성주청, 성벽은 여전히 안개를 꽉 붙들었지만 높이 치솟은 위용 그 자체는 완전히 가릴 수 없었다. 영암부사는 성벽을 뛰어넘어볼 자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누구도 선뜻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괜히 나와 눈이 잠시 마주쳤으나, 오히려 그가 시선을 돌렸다.
안개가 거의 물러날 때 드러난 성문 곳곳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그 앞에는 복면차림 사내 열댓 명이 화살 끝을 우리를 향해 겨누었다. 주변 민가에는 볕이 깃들었으나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까마귀들이 민가들의 지붕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목청을 높였다. 안개가 물러나면서 바람이 불어와 방향을 잃고 사방으로 흙먼지를 일으켰다. 건너편에 우리를 겨눈 궁수들의 팔은 이미 위아래로 흔들렸다. 난 몸을 살짝 숙인 채 눈에 들어온 흙먼지를 닦아냈다.
“길을 비키어라, 목숨은 살려주겠니라!”
영암부사의 고성에도 그들은 각자 자리를 꼿꼿하게 지켰다. 다가갈수록 오히려 활시위를 바짝 당겼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 활을 놓쳤으나 화살은 바람에 휩쓸려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고려 군사가 내던진 창이 바람을 밀어내고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으로 파고들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양쪽에서 돌격하였고 내가 고작 다섯 발 정도 앞으로 나갈 때쯤 문이 열렸다. 피범벅이 된 그들은 고려군사들에 발길에 치여 흙과 돌가루를 묻히며 숨을 천천히 멈추었다.
“이놈들, 나오지 못 할까!”
영암부사의 호령에도 성주청은 입구를 들어선 순간부터 잠잠했다. 바닥엔 사람 발자국이 없었고 건물은 곳곳마다 텅 비었을 뿐. 심지어 성주의 거처 인근에도 인기척은커녕 그 위로 까마귀조차 날아들지 않았다. 그나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라곤 연못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몇 마리뿐.
“장군, 영 수상쩍사옵니다.”
척후들이 영암부사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성주청 구석구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퇴각하면서 잠시 피신시켰던 부관도 그 자리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심지어 지슬을 포함해 그들이 하옥한 자들까지도 모두 자취를 감췄다는 것.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겠느니라.”
낯빛을 어둡게 물들인 영암부사는 서둘러 발길을 되돌렸다. 군사들도 칼과 활로 주변을 경계하며 재빨리 뒤따랐다. 바람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입구에 거의 다다를 때, 난 보고야 말았다. 지붕 위를 조용히 이동하는 검은 복장의 그들을. 주변 건물 곳곳에 그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자리를 잡았다. 영암부사가 황급히 군사들을 재정비했을 땐, 이미 화살 한 발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자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방어진을 제대로 치기도 전에 세 사람이 연달아 쓰러졌고, 대열은 완전히 흐트러졌다.
화살은 영암부사를 향해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그와 곁을 지키던 군사들이 칼로 걷어냈으나 한두 발은 각각 어깨와 팔을 스치고 말았다. 흩어진 군사 중 몇몇이 입구를 향해 내달렸으나, 성문은 이미 닫혔고 온몸으로 들이받아도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화살이 그들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중 한 사람은 목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고 다른 이는 손바닥에 꽂힌 화살을 억지로 뽑아냈다가 그 자리서 주저앉고 말았다. 궁수들이 서둘러 자리를 잡았으나, 쏘아 올린 화살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을 한 명도 끌어내리지 못 하였다. 오히려 그들이 쏜 화살에 쓰러지는 자들만 늘어날 뿐이었다.
“저쪽이다!”
날아든 화살을 걷어내자마자 영암부사는 칼끝으로 성주청 내부를 가리켰다. 궁수들이 화살로 엄호하는 동안 영암부사와 군사들은 몸을 최대한 숙인 채, 바쁘게 발을 옮겼다. 화살 몇 발이 따라붙었지만 누구도 쓰러지진 않았다. 그러나 남은 군사들이 모두 함께 움직인 건 아니었다. 엄호하던 궁수는 물론이고 너무 건물 구석으로 몸을 피한 군사들은 대열에 합류 못 했다. 지붕 위에서 내리 쏘는 화살에 쓰러진 궁수들이 대다수였다. 그 와중에 한 명은 활까지 내팽개치고 겨우 내 쪽으로 피하였다. 괜찮으냐는 물음에 그저 숨을 거칠게 고를 뿐이었다.
툇마루 아래 흙바닥과 간격이 그나마 넓은 건, 그나마 내가 누운 여기였다. 다른 건물들은 간격이 좁아서 그나마 숨은 군사들이 바짝 엎드려 있을 정도였다. 나와 마주한 궁수는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한 편이지만 바닥과 툇마루 간격이 넓지 않아서, 겨우 엎드려서 몸을 숨겼다. 이마저도 경련이 일어난 손끝을 진정시키지 못 한 건, 지붕에서 내려온 그들이 숨은 자들을 하나씩 찾아내더니 가차 없이 끌어냈기 때문. 그나마 저항하던 자들은 곧장 그들의 손으로 바닥에 얼굴을 파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몬딱 끄성불라!”
체구가 작지만 어깨가 떡 벌어진 자의 지휘 아래, 그들은 움직임이 쏜살보다 더 재빨랐다. 최소한 내 시야로 들어오는 곳에 숨은 고려 군사들은 모두 끌려가고 말았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있는 바로 여기. 햇볕을 등에 지고 짙게 물든 그림자들이 발소리와 함께 내 허리춤까지 바짝 다가왔다. 이마에서 흘러나온 땀이 눈으로 들어갔으나 차마 깜빡일 수가 없었다. 함께 있는 궁수도 눈이 시뻘게진 채, 볼을 흙바닥에 갖다 붙이고 나를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그와 난 대열에 있을 때만 스치듯 보았을 뿐, 서로 말을 걸어본 적은 없는 사이였다. 이 순간만큼은 그의 이름이라도 묻고 싶었으나 목은 이미 잠겨버렸고, 콧구멍으로도 숨을 들이마시기도 벅찼다. 그와 나는 어떤 말도 내뱉지 않았으나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서히 눈꺼풀을 천천히 내렸다. 핏물이 흥건한 칼날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을 땐, 마저 눈을 감아버렸다.
“누, 누게냐!”
정작 목소리는 저 너머에서 울렸고, 바닥이 울리고 소란스러움이 귀를 긁어대어 눈을 떠보니. 그림자들은 내게서 멀찍이 떨어졌고 신음과 함께 쓰러지기도 했다. 궁수도 역시 눈을 번뜩 뜨고 손으로 내 발등을 툭툭 쳤다. 그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엔 낯선 자들이 진을 치고 복면 차림 사내들과 뒤엉켰다. 눈을 더 크게 떠보니 군복은커녕 팔다리 살갗이 다 드러나는 거적때기나 다름없었다. 앞장서서 하나둘 쓰러뜨리는 사내와 달리, 나머지는 머리나 어깨로 들이받거나 앞에서 쓰러뜨려 놓은 자들을 발로 밟는 게 전부였다.
“재게 도르라!”
지휘관이 손짓하자 복면 쓴 사내들은 여러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낯선 자들이 서둘러 뒤를 쫓았으나 결국 단 한 사람도 사로잡진 못 했다. 이미 붙들어놓은 자들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멈추지 않는 발길질에 괴성을 잠재웠다.
“어서 갑시다. 장군이 위험하오!”
조금 전까지 앞장서서 싸웠던 자가, 팔을 올렸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따라 대열을 정비했다. 아무리 적게 보아도 열댓 명은 됨직한 그들의 걸음에 시선이 절로 고정되었다. 제 나름대로 빨리 움직이는 듯했으나 대부분 다리를 절뚝거렸고 어떤 이는 한 발짝 내디딜 때보다 몸부림을 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의 시선은 앞장서서 사람들을 지휘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어깨를 매만지면서 다리까지 절룩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걸음걸이 자체가 바로 그였다.
“거기 누군가!”
마침 내게 시선을 돌린 그. 난 양팔을 들고 흔들었더니 그가 바로 코앞까지 순식간에 달려왔다. 옷은 내가 여기서 하옥됐을 때 입은 것과 비슷했고 얼굴이 군데군데 상처까지 선명했지만 그가 확실했다. 여기서 빠져나갈 때 끝까지 나를 구했던 부관.
“자세한 얘기는 장군부터 구하고 하겠네.”
잠깐 미소기가 곁들인 얼굴로 내 어깨를 한 번 두드린 그는, 다시 앞장섰다. 아직도 숨은 궁수에게 손짓한 뒤 나도 그 대열의 맨 뒤쪽에 합류하였다. 여전히 내 손엔 어떤 무기도 없었다. 성주청 건물 몇 개를 지나치자마자 들려오는 건, 사람들이 괴성이었고. 이미 앞마당에는 영암부사와 고려군사, 복면 쓴 사내들이 뒤엉켜 먼지를 일으켰다. 부관의 손짓과 함께 그 속으로 달려들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