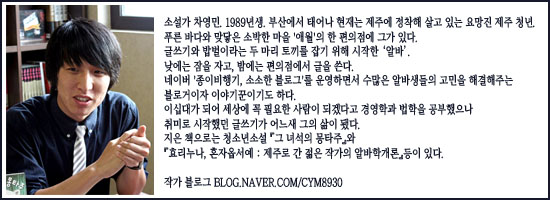차영민 역사장편소설

영암부사의 손을 떠난 화살은 순식간에 왕자에게 바짝 붙었다. 어깨 쪽으로 향하던 화살은, 역풍에 부딪혀 바닥으로 비켜갔다. 함께 있던 탐라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으나 정작 왕자는 꼿꼿하게 고개를 세우고 있을 뿐이었다.
사방으로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왕자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하나둘 휘청거렸다. 이미 넘어져서 몸을 일으키지 못한 자들도 몇몇 있었다. 아주 천천히 풍랑을 해치며 항구로 다가왔다. 깃발만 떨어질 듯 나부낄 뿐, 누구도 선뜻 고개를 내밀지 않은 상태였다. 바람의 방향이 우리가 서 있는 쪽으로 점차 바뀌자, 이젠 고려 군사들까지도 나무나 바위를 붙잡고 있었다. 아예 바닥에 엎디다가 바람과 함께 날아든 돌멩이를 맞고 뒤로 쓰러진 자들도 보였다.
“장군, 속히 피신하여야 하옵니다.”
눈이 반쯤 감긴 부관은 숨을 거칠게 내뱉으며 주변 군사들부터 살펴보았다. 그러나 영암부사는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가 없는 바람에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면서까지, 당긴 활시위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부관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다.
“장군, 재고하심이. 이러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무릎 꿇은 부관에게 영암부사는 화살로 목을 겨누었다. 그것도 잠시, 갑자기 더 깊게 몰아친 바람에 결국 활시위를 놓치고 말았다. 화살은 바람에 쓸려서 부관이 넓적다리를 살짝 파고들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 바짝 세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미 근처 나무를 붙잡던 나는, 진정하라고 소리쳤으나. 두 사람 모두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로지 눈만 쳐다보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바로 근처에 있던 군사가 바람을 업고 날아든 돌멩이를 맞은 채 쓰러졌는데도 눈길도 주지 않았다. 군함은 항구에 뱃머리를 거의 맞닿아가고 고려 군사들은 각자 자리에서 허둥지둥하다가 넘어지기 일쑤였다. 가만히 있자니 가슴이 콱 막히는 터라, 바닥에 작은 돌멩이를 주웠다.
“장군!”
“네놈이 항명하는 게냐!”
특별히 다른 얘기 없이 소리만 치는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졌다. 손에서 돌멩이가 떠나는 순간, 아차 싶었으나 이미 돌멩이는 바람을 타고 내 이마로 금방 돌아왔다. 괴성이 터지면서 뒤로 발라당 널브러졌다. 그제야 두 사람의 고성은 잦아들었고, 부관이 서둘러 내게 달려오더니 손을 내밀었다. 겨우 숨을 모아서 괜찮다고 했더니, 한 번 더 진짜 괜찮은지 물어보지 않은 채 다른 군사들에게 달려갔다.
영암부사는 아예 내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주변 군사들을 살피고 온 부관의 귀를 끌어당겼다. 잠시 두 사람은 시선을 주고받더니, 부관이 한숨과 함께 깃발을 들었다. 곁에 있는 군사가 북을 두드렸다. 탐라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눈치를 살폈으나 왕자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군함은 비바람을 제외하면 어떠한 방해도 없이 뱃머리부터 무사히 포구에 정박하였다. 오히려 화살을 쏘아 올린 건, 영암부사였고. 쓰러진 건, 왕자 바로 곁에 있던 자였다. 그제야 왕자는 고개를 돌렸다. 두 눈에 핏기가 가득한 채로, 영암부사를 올려다보았다. 또다시 화살이 그에게 날아들자, 탐라 사람들은 누구의 명이 따로 없었으나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다. 고려 군사들이 각자 자리에서 활과 칼을 쥐고 기다렸고, 영암부사는 곧장 활시위를 당겼다가 놓으며 한 사람을 쓰러뜨렸다. 왕자도 함께 내달리기 시작했다. 죽창을 바닥에 내던진 채.
“역당을 모조리 소탕하라!”
영암부사는 직접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가깝게 달려온 자를 먼저 나아가 칼로 베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오히려 부관이 군사들을 독려하면서도 주춤거렸다. 난 나무기둥을 꽉 붙들고 두 사람이 다시 서로 쳐다보는 모습에 집중했다. 부관은 고개는 끄덕였으나 눈에 힘을 줬고 턱은 핏줄이 올라와 있었다. 영암부사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으나 목에 핏줄을 바짝 세운 상태였다.
결국 부관을 선봉으로 고려 군사들은 궁수의 엄호를 받으며 돌격하였다. 탐라 사람들과 거의 정면으로 부딪치기 직전에 화살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군함에서부터 말 울음이 울리더니 다시 한 번 화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고려 군사, 탐라 사람들 누구도 맞추지 않고 중간쯤에 다시 떨어졌다. 서로 눈치를 살피며 멈칫했으나 영암부사의 얼굴은 금세 시뻘겋게 피어올랐다. 바람은 점차 잦아들었으나 바닥에 진동이 울렸다.
군함에서는 고려군기를 앞세운 기마부대가 선봉으로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왔다. 경계를 거두지 않은 채 금세 전열을 정리한 그들은, 탐라 사람들 뒤를 봉쇄하였다.
“어디서 온 자들인가!”
부관이 앞장서서 목청을 높였다. 고려 군사들과 탐라 사람들은 각각 무기를 살짝 내려놓은 채,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았다. 영암부사는 갑자기 땅바닥을 걷어차더니 칼자루를 꽉 쥐고 앞서 나갔다. 나도 일단 나무에서 떨어져 고려 군사들 맨 뒷자리쯤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얼 하는 것이냐, 역당들을 소탕하지 않고!”
칼을 빼 든 영암부사는 왕자에게 달려들 듯 나아갔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건, 바로 또 다른 고려 군사들 사이에서 나온 한 사람이었다. 전반적으로 어깨가 좁고 체구가 작았으나 팔다리는 갑옷에 금이라도 생길 만큼 굵다랬다. 뭉툭한 코 밑에 수염이 덥수룩했으나 턱밑은 몇 가닥만 드러날 정도였다. 곁에 자신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큰 군사들을 뒀는데도 전혀 기운이 약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영암부사를 보자마자 팔을 번쩍 들었다.
“형님, 무탈하셨습니까!”
“아우가 어인 일인가!”
영암부사는 눈이 동그래진 채 역시 팔을 번쩍 들었다. 왕자와 탐라 사람들은 양쪽을 번갈아 보며 서로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맞은편에 있던 자는 목소리 자체가 몸집과 달리 우렁찼다. 영암부사와 그, 두 사람은 잠시 목청을 크게 틔워 안부를 나눴다. 그 사이 왕자는 얼굴을 잔뜩 붉히더니 탐라 사람들 앞으로 나왔다.
“지금 뭐허는 거꽈?”
이건, 나도 묻고 싶었다. 군사들 틈 사이를 비집고 나가 부관 바로 뒤에 자리를 잡았다. 혼잣말처럼 저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부관이 혼잣말처럼 ‘고여림’ 장군이라 일러줬다. 고여림이라, 내가 장인어른 덕에 도성을 드나드는 장수들은 제법 아는 편이지만. 그의 이름은 자못 낯설었다. 좀 가까이서 보니 영암부사만큼 얼굴에 주름으로 굵게 잡혀 있었다. 그는 왕자를 유심히 쳐다보며 영암부사에게 눈짓하였다.
“저자를 사로잡아야 하네!”
왕자는 영암부사가 칼을 뽑자, 곁에 있던 사람에게 죽창을 건네받았다. 다시 고려 군사들이 활시위를 당기고 돌격 태세로 전환하자, 고여림이 잠시 지켜보더니 칼을 번쩍 들고 허공에 휘저었다.
“왜들 이러십니까!”
홀로 탐라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고 순식간에 영암부사 앞까지 달려갔다.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숨부터 골라낸 그는, 갑자기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고려 군사들이나 탐라 사람들 모두 그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지금 뭣하는 건가!”
영암부사 역시 핏기가 가신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왕자의 눈빛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는 팔로 두 사람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귓속말을 주고받던 그들은 갑자기 어깨동무하면서 웃어 보이는 게 아니던가. 특히 영암부사와 왕자가 서로 쳐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몸을 비틀었다. 고려 군사들과 탐라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모두 웅성거렸고, 특히 부관은 얼굴에 땀으로 가득한 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어째 심상찮소.”
중얼거리듯 내뱉은 그의 말이 내 귀에 깊이 박혀 들었다. 나 역시도 그들의 모습이 예사롭지는 않았다. 왜 그러냐고 영암부사에게 직접 물어봤으나 돌아오는 건 더 큰 웃음뿐이었다. 이곳에 모인 군사들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았고, 고여림 장군 일행을 성으로 안내하였다. 성주청 앞에 도착하자마자 왕자는 사람들을 모으더니 느닷없이 잔치를 열게끔 준비해달라고 일렀다. 영암부사 휘하 고려 군사들은 그동안 성 주변 경계를 맡았다.
“좀 전에 내가 잠시 언급했던 그이일세.”
난 영암부사의 막사에서 고여림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왕자도 함께 통성명하며 또다시 웃음을 남겼다. 도대체 여기서 왜 웃음이 나와야만 하는 건지. 갑자기 웃음을 이끌어낸 고여림도 그렇고, 여태껏 심각했던 영암부사마저도 지금 입가에서 웃음을 떠나보내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웃게 했단 말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