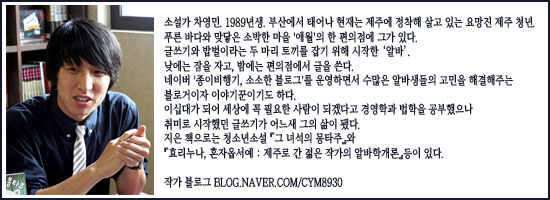차영민 역사장편소설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성주청 앞마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먼저 온 사람들은 금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몸을 비틀거렸고, 한 잔이라도 더 먹으려고 안간힘이었다.
해가 높이 올라갈수록 사방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부터 온몸이 비쩍 말라서 제대로 걷지 못한 이가 많이 보였다.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성한 자가 음식을 더 많이 챙겨 먹었다. 드문드문 다른 사람부터 먼저 챙기는 자들도 있었다. 특히 아이들은 얼굴에 눈물범벅이 된 상태로 손에 쥔 감자를 놓지 않았다.
고여림 장군의 군사들이 음식을 가지고 올 때마다, 사람들은 먹다 말고 환호성과 함께 두 손을 번쩍 들었다. 군사들은 술과 음식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었다. 군량이 아니냐고 부관에게 물었으나, 자신도 사정을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와중에 내 눈길을 끄는 건, 영암부사와 고려 군사들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권해도 들은 체하지 않고, 각자 자리에 목석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다. 영암부사는 고여림 장군과 나란히 앉았지만 서너 번에 찔끔찔끔 나눠서야 술잔을 다 비워냈다. 내 옆에 앉아있던 부관은 군사들의 동태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비웠다. 그의 술잔 역시 처음 따라놓은 그대로였다. 나 역시도 눈앞에 술과 고기가 푸지게 차려졌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고기는 어디서 온 건가?”
“대해를 거닐다 보니 하늘에서 똑 떨어졌지 뭐요. 이게 다 형님 대접하라는 게 아니겠소?”
영암부사와 고여림 장군은 술잔을 부딪치며 목소리에 한껏 흥을 실었으나, 얼굴은 거멓고 물든 그대로였다. 내 맞은편에 자리 잡은 왕자도 같이 웃어주긴 했으나 계속 주변 눈치를 살폈다. 중천에 솟았던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동안 주변은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사람들도 대부분 돌아간 지 오래였다.
“언제까지 영 헐 거꽈?”
술병을 만지작거리던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에 앉은 자는 이미 탁자 위로 엎디어 잠이 들었으나 정작 자신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첫 술잔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었다.
“기다려보시오.”
고여림 장군은 주먹을 살포시 쥐고 탁자를 내리쳤다. 미세하게 남은 웃음기를 거두었다. 그의 손바닥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저 멀리서 부관이 군사들과 함께 달려왔다. 눈을 지그시 감고 뒤로 고개를 젖혔던 영암부사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군, 잡았나이다.”
고려 군사들 손에 몇몇 사람이 붙들려왔는데 모두 아침에 봤던 얼굴이었다. 다리를 저는 제법 앳된 얼굴의 사내와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재빠른 노인, 배가 봉긋이 나온 젊은 여인, 한쪽 눈을 뜨지 못 하는 남자아이까지. 얼굴부터 팔다리까지 온통 흙과 피로 범벅이었다.
“네놈들이 간자인 게냐!”
영암부사는 술잔을 한 번에 비우고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중 사내의 고개를 손으로 들더니 곧장 세차게 후려쳤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 새도 없이 손바닥이 다른 쪽 뺨을 쓸었다. 발로 어깨를 걷어차고 밟으면서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라며 목청을 높였다. 사내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살려달라고 머리를 땅바닥에 붙일 뿐이었다. 만삭의 여인이 사내 옆으로 붙더니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바른대로 고하라!”
영암부사가 흰자위를 드러내자 고여림 장군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두 팔로 잡는 시늉을 보였다.
“이러다가 사람 죽겠소이다!”
“역당이 어찌 사람인가, 개돼지만도 못 하니라!”
영암부사가 칼을 뽑으려고 하자, 뒤에 가만히 서 있던 왕자가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두 눈에 날을 바짝 세우면서 이를 꽉 깨물었다. 그를 슬쩍 흘겨보던 고여림 장군이 입을 영암부사 귀에 바짝 붙였다.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왕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짚더니 사내 앞으로 끌어내듯 안내했다.
“혹여 이 자와 안면이 없소?”
나는 보았다. 사내를 내려다본 순간, 흔들린 왕자의 눈빛을. 굳어버린 얼굴로 고개를 살며시 내젓자, 사내의 눈이 미세하게 커지더니 다시 머리를 바닥에 붙였다. 여인은 울부짖으면서 왕자의 발목을 붙잡았다. 누구도 말릴 기미가 없었고 왕자가 몸을 뒤로 빼려고 하자, 여인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졌다.
“다시 묻겠소, 정녕 안면이 없는 자들인가!”
영암부사는 눈에 핏줄을 세우면서 왕자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칼을 건네주며 사내를 향해 눈짓하였다. 고여림 장군이 두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으며 고갯짓하였으나, 잠깐 머뭇거리던 왕자가 제 손으로 칼을 쥐였다.
순식간이었다. 미처 내가 한마디라도 뱉어낼 새도 없이 사내와 여인의 목소리는 땅바닥에 붉게 물들이며 잠잠해졌다. 칼끝은 곧장 영암부사를 향했다. 왕자의 얼굴엔 핏물이 가득했고 그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칼날보다 더 날이 서 있었다.
“그 칼 거두지 못 하겠소!”
고여림 장군이 한 발자국 앞서나와 두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영암부사는 눈에 힘은 풀지 않았지만 팔짱까지 끼며 조소를 감추지 않았다. 군사들은 일제히 왕자를 향해 칼과 활을 겨누었다. 노인과 아이는 서로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얼굴에 눈물로 뒤덮였고 술기운에서 벗어난 탐라 사람들은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난 그저 궁금했을 뿐이오.”
영암부사가 미처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노인과 아이는 끌어안은 그 자세로 쓰러졌다. 군사들이 조금씩 거리를 좁혀도 왕자는 다시 영암부사에게 칼끝을 겨누었다.
“돼수과?”
왕자는 칼을 바닥에 던졌다. 군사들이 그를 포박하려고 하자, 고여림 장군은 바로 제지하였다. 영암부사는 부관이 주워서 건네준 칼을 받으며 슬쩍 웃음기를 드러냈다.
“어찌 과민하십니까? 저들은 간자로 잡혀왔고, 난 그저 안면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거늘.”
군사들이 주검을 거두는 동안 탐라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영암부사는 왕자에게 다가가 팔을 어깨 위로 걸쳤다. 다른 손은 방금 그가 사용했던 붉게 물든 칼을 높이 치들었다.
“뭐하는 거꽈?”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사온데.”
둘은 오로지 앞만 쳐다보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여전히 가까운 데 서 있던 난 두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대신 탐라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는 얼굴만큼은 생생했다. 하얗거나 퍼렇게 질려버린 혈색, 눈이 찌푸려지고, 몸은 뒤로 살짝 젖혀졌다. 서로 눈치를 살피면서 특히 왕자에게 싸늘히 식어버린 눈빛을 아끼지 않았다.
“역당들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하지 않겠소이까? 보여주시오, 나라를 위한 충심을.”
“무신 말이꽈…….”
도저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군사들은 딱히 나를 막진 않았다. 대신 어디든 멀리 나가지 말라는 얘기만 남겼을 뿐.
해는 점점 기울었고 내 발은 성주청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지나치는 민가에는 아침부터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아이는 마당에서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한 손 가득 쥐고 있던 감자를 품속으로 넣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성벽이 달빛을 살포시 가렸다. 바로 그 아래 낯선 그림자 세 개가 눈에 들어왔다.
“누구냐!”
오른쪽에 선 그림자 두 개는 고려 군사들이었다. 어깨가 붙들린 맞은편 그림자는 체구가 제법 다부진 사내였다. 군사들과 맞서서 힘겨루기를 하였는데 좀처럼 밀릴 기세가 없었다. 오히려 군사 한 명이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다른 군사는 창을 겨누기 시작했다.
“무사마씸!”
난 조용히 뒤로 물러나던 중 귀가 쫑긋하여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니, 넘어진 군사가 일어나면서 나를 창을 겨누며 누구냐고 소리쳤다. 가까이 오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으나, 몇 발자국 더 나아가도 딱히 달려들진 않았다. 그사이 내 걸음을 돌린 사내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다. 바로 그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