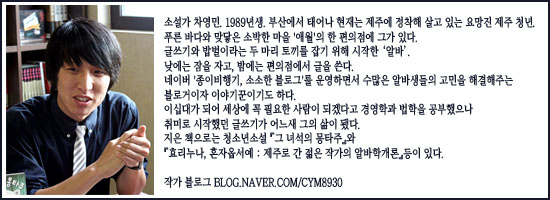차영민 역사장편소설

“지슬?”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 어둠에 묻혔으나 분명했다. 눈이 동그래질 새도 없이 창을 겨눈 군사가 지슬의 얼굴을 후려쳤다. 몸을 일으킨 다른 군사도 발바닥으로 지슬의 아랫배를 걷어차더니 곧장 내게 달려왔다.
“누구냐고 묻지 않았소!”
대답하기도 전에 내 뺨으로 파고든 그의 주먹. 잠시 눈앞이 캄캄했다가 밝아졌을 땐,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다리가 아니라 그의 두 팔이 내 뒷덜미를 끌어당기는 중이었을뿐. 지슬도 마찬가지로 뒷덜미가 붙들렸고 몸부림은 그저 흙먼지만 일으켰다.
질질 끌려가던 다리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여기 오기 전까지 있었던 성주청 앞마당이었다. 눈앞엔 영암부사가 인상을 쓴 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곁에는 고여림 장군과 왕자가 서 있었다.
“자네가 어찌?”
영암부사의 부관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나와 함께 온 군사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꽂았다. 내가 괜찮다고 손짓과 함께 말했으나 곧바로 이어진 부관의 발길질까지 막아낼 순 없었다. 지슬을 붙들고 있던 군사는 멈추지 않는 발길질에 견디다가 팔로 밀어냈다.
“수상한 자가 확실하옵니다.”
가늘게 찢어진 눈을 바짝 세운 그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영암부사가 손짓하자 부관은 뒤로 물러났고, 군사는 무릎을 꿇었다. 거동이 수상하여 불러 세웠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내용까지는 내가 멀리서 본 모습도 있어서 일단 그의 입을 지켜봤다.
“저 자도 우리를 위협했사옵니다!”
그의 손이 나를 가리켰다. 일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내 얼굴로 향했다. 영암부사와 부관에게 지슬을 알아보지 못 하느냐고 되물었다. 고개를 내젓는 영암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주청을 기습할 때 함께했었던 부관마저도 눈만 멀뚱히 뜨고 있을 뿐이었다.
“역당이다!”
왕자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삿대질과 함께 목청을 높였다. 다른 탐라 사람들도 순식간에 입을 모았고 왕자 역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슬은 그들을 올려다보다가 왕자에게 시선이 멈췄다. 왕자는 황급히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사이 부관에서 얻어맞고 넘어진 군사는 다시 내 뒷덜미를 붙들려다가 영암부사의 손짓에 뒤로 물러났다.
“왜 그랬는가?”칼자루를 바닥에 내리친 영암부사가 군사들은 뒤로 완전히 물리고 지슬을 내려다보았다. 그저 집으로 가던 길에 군사들과 마주쳤고 누구인지 묻기에 근처 산다고 하니 신분을 제대로 밝히라며 다그쳤다고. 조금 전까지 자신을 붙들었던 군사가 창대 끄트머리로 어깨를 밀어내면서 이죽거리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내가 봤던 모습에 지슬이 말한 대로라면 딱히 어색할 구석은 아니었다.
“아니옵니다. 저놈이 먼저 주먹으로 위협했사옵니다.”
지슬을 붙든 군사가 뒤에서 소리쳤다. 갑자기 왕자 뒤에 서 있던 사내가 달려 나오더니 어깨로 나를 밀어내고 지슬의 멱살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무사 그짓말햄나. 가이랑 이신 거 봐신디!”
“가이?”
지슬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깨는 좁았으나 머리통은 컸고 가늘고 기다란 팔다리는 볼록하게 옷 밖으로 비집고 나온 뱃살이 눈에 띄었다. 특히 가늘게 시작했다가 굵게 마치는 목소리도 귀를 간질였다. 무엇보다 내 눈을 섣불리 깜빡일 수 없게 한 건, 그의 목소리에 환호하는 탐라 사람들이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지슬이 ‘가이’랑 있다는 걸 봤다고 했다. 그 ‘가이’가 누구냐고 되묻는 지슬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자도 생겼다. 고여림의 군사들이 탐라 사람들을 가로 막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들이 누굴 일컫는 게냐?”
영암부사가 군사는 물론 사람들을 모두 뒤로 물러나게 했다. 나를 자신의 곁에 세워두고 지슬과 눈을 마주보았다. 이 와중에도 돌멩이 한두 개가 더 날아들더니 어깨와 다리를 스쳤다. 영암부사의 눈꼬리가 올라가자, 군사들이 무기를 빼들었고 왕자는 사람들을 손짓으로 물려내면서 한 발자국 나아왔다.
“지금 역당이영 곹은 편 먹젠햄수과?”
칼까지 빼든 군사들을 단숨에 밀어내며 영암부사 앞으로 다가간 왕자, 지슬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다. 서서히 일어나더니 왕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순식간이라 오로지 영암부사만 노려보던 왕자는 다리가 꼬여 바닥에 주저앉듯 넘어지고 말았다.
탐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달려들려고 하자, 고려 군사들은 재빠르게 대열을 만들어서 가로막았다. 왕자는 팔꿈치로 지슬의 이마를 내리찍으면서 일어났다. 곧바로 지슬도 몸을 일으키더니 머리로 왕자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 치고받는 사이 영암부사, 고여림 장군, 나까지 세 사람은 잠시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직접 그 사이로 끼어들려고 했으나 고여림 장군이 손을 내저었다.
“왜들 이러시오!”
대신 왕자가 돌멩이를 바닥에서 주우려고 할 때, 고여림 장군이 발로 걷어냈다. 두 팔로 꽉 붙들었고 달려들려는 지슬은 가장 가까운 내가 뒤에서 어깨를 붙들었다. 두 사람은 영암부사 앞에 세웠고, 군사들은 탐라 사람들을 묵묵히 막아내고 있었다. 좀처럼 호흡을 고르지 못 하던 두 사람 중 먼저 입을 연 것은 바로 지슬이었다. 영암부사와 고여림 장군의 얼굴에 어둠이 짙게 번졌다. 왕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이마는 땀으로 뒤덮였다.
“다시 고라주카마씸?”
지슬이 목에 핏대를 굵게 세웠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도 목처럼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도 절로 고개를 끄떡일 수밖에 없었던 건, 지슬이 뱉은 얘기가 머릿속에 깊숙하게 박혀들었다.
“진정 나를 희롱하는 게 아니더냐?”
영암부사가 지슬과 왕자,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슬은 오히려 눈에 힘을 더 줬으나 왕자는 목청을 높였으나 눈치를 살피더니 얼굴에 땀으로 흠뻑 젖고 말았다. 고여림 장군의 명에 따라 군사들이 다가와서 왕자를 포박했다. 저 멀리서 지켜보던 탐라 사람들이 고성을 내질렀으나 군사들에게 막혀서 움직이질 못 했다.
“어떵 야이가 곳는 것만 들엄수꽈!”
몸부림하며 소리치던 왕자를, 영암부사가 주먹으로 뺨을 내리치더니 오른쪽 옷소매를 걷었다. 발목 아래에 까만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탐라 어느 가문을 표시한 것이라 하였다.
지슬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왕자는커녕 성주 집안사람조차 아니었다. 도대체 탐라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를 왕자라 칭하고 극도로 보호하려 했단 말인가. 영암부사가 멱살을 붙잡고 정체와 배후를 밝히라고 호통하였다. 곧바로 칼을 뽑아 그의 목에 갖다 댔는데 이미 오른쪽 귀는 피를 머금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비명 한 번 없이 손으로 귀를 부여잡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칼끝을 목에 바짝 붙여도 배후는커녕 자신의 정체까지 어떤 것 하나도 내뱉지 않았다. 영암부사가 발길질을 퍼붓다가 얼굴이 온통 피로 가득한 그를 군사들을 시켜 하옥하였다.
조금 전 지슬의 멱살을 붙잡은 자부터 시작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동조한 자들도 모조리 군사들이 잡아들였다. 도망하던 자들도 군사들이 흩어져서 추격한 끝에 모두 붙들려서 성주청 앞마당으로 모였다.
달은 서서히 기울어 갔으나 앞마당 곳곳에 놓인 횃불은 바람과 함께 거칠게 흔들렸다. 잠시 하옥한 왕자라고 불렸던 자와 함께 있던 탐라 사람들이 모조리 군사들에 둘러싸인 채 영암부사 앞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난 고여림 장군과 함께 영암부사 곁을 지켰고, 지슬은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다른 군사의 호위 같은 감시를 받으며 서 있었다. 붙들린 자들의 시선은 모두 지슬을 향하였다. 한마디씩 혼잣말처럼 내뱉었으나 무슨 뜻인지는 도저히 알아들을 순 없었다.
초점이 사라진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지슬, 점점 짙어지는 낯빛으로 지슬과 탐라사람들을 번갈아 살펴보는 영암부사, 알 듯 말 듯 미묘하게 미소를 머금고 뒷짐까지 진 고여림 장군, 여전히 아무런 말없이 바닥에 얼굴을 묻어버린 왕자라고 불렸던 자, 지슬과 나를 노려보는 군사 둘, 이들 사이에서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나까지.
그동안 지슬은 어디에 있었고, 진짜 왕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인지, 영암부사와 고여림 장군은 여기서 무얼 한단 말인지, 난 이제 어디서부터 뭘 정리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과연 개경에 돌아갈 수 있는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