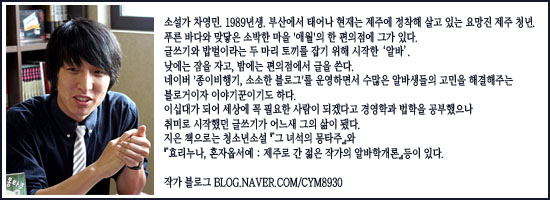차영민 역사장편소설

도대체 어찌 저것이 눈 앞에 있단 말인가. 그것도 영암부사가 아닌 고여림의 손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에 서린 이슬은 먹구름을 머금었다. 그가 내민 손을 잡았으나 선뜻 일어날 수가 없었다.
“어서 일어나시게!”
그는 목소리 끝에 힘을 주었다. 덩달아 나도 몸을 일으켰다. 창살 너머로 마주 본 그의 얼굴은 실핏줄이 군데군데 서려 있었다. 거칠게 숨을 내쉴 때마다 술 냄새가 퀴퀴하게 풍겨 나왔다. 그의 주변에는 누구의 인기척도 없었다. 그저 간간히 머리 위로 까마귀의 그림자만이 스칠 뿐이었다. 나의 뺨을 훑는 거칠거칠한 바람보다 날이 바짝 선 그의 눈빛에 절로 고개를 내리고 말았다. 이내 그의 손이 내 턱을 밀어 올렸고 다시 눈이 마주친 채 침묵 속에 휩싸였다. 달빛을 깊숙이 머금은 그의 눈동자에서 나는 보고야 말았다. 눈앞에서 목이 달아난 수문장의 얼굴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렸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녕 네놈이 기록한 것이냐?”
내 품으로 돌아온 서책, 오른쪽 아래 모서리가 눅눅한 것 말고는 온전한 상태였다. 서책의 중간쯤을 펼치고 그와 번갈아 쳐다보았다. 횃불 곁으로 몇 걸음 함께 움직인 뒤, 내가 쓴 부분을 직접 읽어주었다. 지난번, 영암부사의 모든 행적을. 정작 돌아온 건, 내 뺨을 스친 그의 주먹이었다. 바닥에 서책과 함께 넘어졌으나 더 이상의 주먹이나 발길질은 날아들지 않았다. 대신 넘어진 내 곁에 그가 무릎을 꿇었다.
“네놈을 믿지 못 하겠니라.”
직접 서책을 주워든 그는, 내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펼쳐서 눈으로 거듭 읽었다. 앞부분과 뒷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더니 던지듯 내 품에 도로 안겨주었다. 내가 몸을 일으키는 사이, 그는 머리를 바닥에 파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주먹으로 바닥을 연신 내리치더니 괴성과 함께 몸부림까지 숨기지 않았다. 그제야 주변에서 낯선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잠시, 다시 침묵으로 돌아온 그가 손짓하자 그림자들은 모습을 금세 감추었다.
“네놈을 믿고 싶지 않으나 지금은 별도리가 없구나.”
조용히 일어선 그는 손을 내밀었다. 함께 그의 처소로 향하였다. 조금 전 봤던 낯선 그림자들은 조용히 우리를 뒤따랐다.
그의 처소는 영암부사 집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막사였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발 디딜 틈도 없이 군데군데 널브러진 깨진 술병이었다. 거의 맨발이나 다름없는 짚신은 조각들을 모두 막아내진 못 했고, 발가락 사이에 피를 내고 말았다. 그는 딱히 개의치 않고 침소 곁에 눕혀놓은 의자를 바로 세워서 내게 건넸다. 정작 자신은 침소에 거의 눕듯이 앉더니 술병을 들고 금세 다 비워냈다. 술 냄새가 그의 입에서 더 진하게 풍겼으나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총기가 서려있었다.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군.”
목소리도 눈빛만큼이나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눈을 지그시 감은 그는, 서책에 적힌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내가 탐라에 내려온 연유부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서책과 비교하며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그는 연신 고개를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며 경청하였다. 거의 동이 트려고 할 때쯤, 서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좋다, 네놈이 해줘야 할 일이 있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끝마치기 무섭게 그가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다. 막사 주변에 그림자가 여럿 나타나더니 예닐곱 정도 사내들이 들어왔다. 군복 차림이 아니었고 검은색 천을 거의 눈만 빼고 두른 형태였다. 모두 체구가 나와 비슷하게 작은 편이었으나 발걸음 한 번 내딛는 것조차 조용했으며 재빨랐다. 그중 한 사람이 고여림 장군 곁으로 다가가더니 귓속말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움직이거라. 반드시 누구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될 것이니라.”
그가 직접 내게 옷을 건네줬다. 위아래로 온통 검게 물든 천이었고 그 자리에서 곧장 얼굴까지 둘렀다. 서책은 내게 아닌, 귓속말을 주고받았던 자의 품으로 들어갔다. 나를 포함해 들어온 이들을 한 줄로 세운 그는, 말 대신 눈으로 한 명 한 명 쳐다보았다. 특히 내게는 눈에 힘을 더 실었다. 이들과 무얼 해야 하냐고 아주 나직하게 물었으나 그저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게 대답의 전부였다.
그의 처소에 나오자마자 조용히 이동하였다. 심지어 군영을 경계하는 군사들의 시선까지 피하기 위해, 막사 사이사이로 두세 명이 한 조가 되어 한 줄씩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난 중간에 끼어서 그의 속도에 맞추기 버거웠으나 앞뒤로 밀고 당기는 터라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군영을 벗어나자마자 민가 골목 사이로 움직였고 군사들과 마주침을 모두 피하였다. 이들과 함께 다다른 곳은 북쪽, 바닷가 방향 성벽이었다. 작은 성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긴 보통 백성들이 오가는 통로가 아니었다. 다른 곳보다 반도 안 되는 높이의 성문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만이 나가는 길이었다. 탐라에 있을 때 간간이 듣기를, 저곳을 나간 송장은 있어도 들어 온 사람은 없다는 것.
그 때문일까, 주변을 경계하는 군사들의 수가 대여섯 명이 전부였다. 그중 둘은 벽에 기대에 잠들었고, 나머지도 불 앞에 앉아서 감자를 먹느라 주변을 그리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성벽 위로는 아예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도 그들과 눈을 마주쳤으나 역시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 각자 조용히 전열을 정비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맨 뒤로 밀려났다. 민가 담벼락 한구석에 자리 잡고 웅크려 있었다. 돌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에 아주 잠깐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몰렸으나, 정작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은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했다.
고여림 장군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던 자가 가운데에 앞장서고 나머지는 세 명씩 양쪽으로 흩어진 그들은, 서로 수신호를 간단히 주고받자마자 곧장 돌진하였다.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은 바람이 부는 소리에 묻혔고, 성문 앞으로 다다랐을 때는 군사들이 모두 쓰러진 상태였다. 성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의 손짓에 얼른 뒤따랐다. 곧게 뻗은 길을 두고 나무와 풀이 우거진 곳만 찾아서 나아가다보니 금세 바닷가였고 작은 포구가 있었다. 그곳에는 나룻배보다는 조금 크지만 어선보다 작은 배가 정박해 있었다. 재빨리 배에 모두 올라탔고 조금씩 포구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빠져나온 성문이 어렴풋하게 보였는데 성벽이나 그 주위로 어떤 그림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배는 점점 거칠어지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고 햇볕이 점점 바닷물에 불그스름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섬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쯤에서야, 우리를 이끌었던 자가 얼굴을 드러냈다. 각진 턱에 뾰족하게 세운 코, 위로 예리하게 찢어진 눈꼬리와 우묵하게 모인 입술이 눈에 금방 들어왔다. 나머지는 번갈아가며 노를 저을 뿐,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다.
“곧 파도가 일겠다, 서둘러라.”
그는 생김새와 어울리게 말끝에 날을 바짝 세웠다. 마침 나와 눈이 마주친 터라,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혼잣말처럼 슬쩍 물어보았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의 입에서 “개경”이란 단어가 튀어나왔다. 눈이 동그래진 건, 목적지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탄 배는 딱히 굵지 않은 나무로 엮었고 누구 하나 움직이기라도 하면 배 전체가 휘청거렸다. 물살의 흐름만큼 배도 아주 정직하게 움직였다. 큰 배로 탐라를 내려오기 몹시 어려웠던 터, 어찌 이런 배로 바다를 가른단 말인가. 고개를 돌려봤으나 이미 섬의 모습은 물안개에 완전히 묻히고 말았다.
“걱정 말거라, 조금만 더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배가 있다.”
그는 앞만 내다보며 무심한 듯 툭 내뱉었다. 가슴에 묵힌 호흡을 다 내뱉지 못 한 건, 당장 물살이 더 심상치 않았다는 것. 조금 전 그가 처음 내뱉은 말처럼 당장 파도가 몰려와도 이상하지 않았다. 저 멀리서 점점 몰려오는 시커먼 구름이 햇볕을 가렸고 주변은 물안개가 더 짙게 감쌌다. 얼굴과 팔다리는 이미 튀어 오른 바닷물에 흠뻑 젖은 상태였다. 이들은 더 이상의 말없이 묵묵히 노를 저었고 돛을 펼쳤다. 나는 한가운데에서 우물쭈물했는데 배 전체가 갑자기 높아졌다. 소리를 내지를 새도 없이 몸 자체가 붕 뜨면서 가벼워졌다. 바닷물이 눈 앞을 가리기 바로 직전, 분명히 보았다. 안개 속에 숨은 낯선 뱃머리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