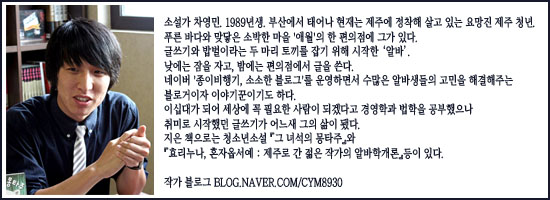차영민 역사장편소설

삼별초, 어둠이 햇빛에 물러나면서 드러난 그들의 옷차림새로 확신이 들었다. 전체적으로 고려군과 비슷하지만 오른쪽 가슴팍에 새겨진 괴이한 형상의 문양은 오로지 삼별초만 쓰는 것이다. 호흡이 급격히 가빠왔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몰려든 인파 사이로 약간 물러난 상태에서 이문경을 다시 살펴보았다. 머리부터 팔다리가 깡마르고 날이 선 턱과 눈썹은 위로 바짝 올라간 얼굴이었다. 오른쪽 뺨부터 귀까지 드러난 칼자국은 검붉게 물든 게 더 눈에 선명했다. 그의 눈길이 내 얼굴에 닿았다.
“거기서 뭐하시오?”
그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을 동그랗게 떴다. 부러진 나무 기둥에 살짝 기대어 반쯤 주저앉은 상태였다. 눈은 자연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심호흡하려던 중, 그림자 하나가 갑자기 곁으로 다가오더니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떵 이디 이신 거꽈?”
고개를 조심스럽게 올렸다. 산발한 머리칼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햇볕이 그의 뒤통수를 쬐어 곧바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어깨에 올라간 손을 살짝 밀어내고 옆으로 비켜섰다. 나도 모르게 입을 오므렸고 손가락이 올라갔다. 비록 시커먼 흙이 얼굴에 잔뜩 묻었지만, 전체적인 윤곽도 말똥한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성주가 나를 하옥시켰을 때, 바로 맞은편에 있던 자 중 한 명임을. 내가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는 단순히 탐라 사람만이 아니었다. 개경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안내한 뱃사공 중 한 명이었다. 나야말로 묻고 싶었다. 당신이야말로 어찌 여기에 있는 건지.
“잘도 반가운 게 마씨!”
내 손을 꽉 잡은 그는 부둥켜안기기까지 했다. 두 손으로 밀어냈으나 그 힘을 막아낼 순 없었다. 잠깐 안긴 순간, 그가 혼잣말처럼 무어라 내뱉었으나 동시에 호령하는 이문경의 목소리가 뒤덮어서 제대로 듣진 못했다. 원래 자리를 향해 돌아서던 짧은 순간 내게 보낸 눈빛은 낭랑한 말투와 달리 심히 흔들리고 있었다. 안면이 있지만, 그의 이름은 몰랐다. 옥사에 있을 때, 죽지 않았는지 서로 안부만 몇 번 물은 게 전부였을 뿐. 나를 제외하면 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자일지도 모르니 더 그의 눈빛 하나에 머리칼이 곤두섰다.
날이 밝으면서 모여든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어림잡아도 족히 백여 명은 넘었다. 저 멀리 성벽이 어렴풋하게 보였지만 이때부터는 삼별초 군사들은 은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문경이 직접 새로 모인 자들을 체격별로 분류했고, 그중 몇몇은 검과 활을 쥐여주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한둘씩 모여든 사람들과 합쳐서 전열을 갖추니 그 수세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해방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게요. 그대들과 함께하여 영광이외다!”
이문경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함성으로 화답하였다. 곧바로 성을 향해 움직였다. 성문이 가까워지자 전열을 넓게 펼쳤다. 난 그중에서 이문경과 그리 멀지 않게 뒤쪽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이문경이 손짓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쳤고 성벽 위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고려군의 모습이 점점 드러났다.
“어디서 온 패당들이더냐!”
성문 앞으로 거의 다다르자, 이문경이 멈추라고 손짓했다. 누각에서 수문장으로 보이는 자가 큰소리를 내질렀다. 성벽 위로는 궁수들이 활을 겨눴지만 바람 때문에 모두 몸이 흔들거렸다. 탐라 사람들은 주춤거리며 슬쩍 서로 눈치를 살폈다. 그에 반해 군사들은 각자 무기를 꽉 쥐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문경은 갑옷을 살짝 매무시하더니 혼자서 성문 쪽으로 성큼성큼 나아갔다. 양쪽 성벽에서 화살이 몇 개 날아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발 앞까지 날아든 화살에도 움찔하지 않았다. 성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선 그는 칼을 뽑고 고려군에게 겨눴다. 화살은 더 이상 날아들지 않았다.
“이놈들아, 당장 성문을 열어라. 오랑캐에게 숙인 고개가 부끄럽지도 않더냐!”
그의 호령에 성벽은 술렁였다. 탐라 사람들도 서로 얘기를 주고받더니 물러났던 몸을 군사들처럼 앞으로 기울였다. 난 몸을 숙인 채, 아까 잠시 얘기했던 자의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낫을 꽉 쥐고 주저앉은 채로 바위에 기대있었는데 두 다리를 심히 떨고 있었다. 다른 이들도 떨긴 했으나, 그는 정도가 좀 심한 편이었다. 조용히 곁으로 다가갔다. 괜찮으냐고 나직하게 물으니, 땀으로 가득하고 시퍼렇게 질린 낯빛을 천천히 드러냈다.
“이디서 영 죽어불민 어떵할 거…….”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내리깔렸다. 조금 전, 혼잣말과 눈빛의 이유를 묻고 싶었으나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문경이 뻗은 칼끝을 향해있었다.
“오랑캐에 굴복한 자들을 몰아냅시다, 고려의 새 시대를 이 땅에서 엽시다!”
그의 호령은 군사들의 함성을 금세 불러일으켰다. 탐라 사람들은 잠깐 머뭇거렸으나 함성에 목소리를 합쳤다. 선봉의 군사들이 방패를 세운 채 한 발짝씩 전진했다. 성문이 가까워질수록 성벽 위에 고려군들은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다듬었다. 고려군이 겨눈 화살촉 끝부분이 햇볕을 머금었다. 수문장은 직접 창을 내던지면서까지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이문경은 자신의 발 앞에 꽂힌 창을 뽑더니 도로 누각으로 내던졌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자신에게 집중된 화살 세례를 꿋꿋하게 막아냈다. 그중 몇 개는 팔다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쳤으나 그리 미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삼별초 군사들이 화살을 쏘아 올리자, 성벽에서 고려군이 하나둘씩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누각 한가운데 서 있던 수문장은 자신에게 날아든 화살을 가까스로 피하더니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성문을 열어라!”
이문경의 호령과 동시에 성벽은 선봉대가 직접 타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장악하였다. 성문도 금방 열리고 말았다. 전투라고 할 것도 없었다. 양쪽에서 화살을 약간 주고받다가 고려군이 갑자기 후퇴한 것뿐. 성벽에서 떨어진 고려군 몇몇만 숨을 거뒀고 삼별초와 함께한 탐라 사람들은 티끌 하나의 상처도 남기지 않았다.
“멈추지 마라, 오랑캐 하수인 패당을 모조리 몰아낼 것이다.”
가장 먼저 성문에 들어선 이문경은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민가 사이에 높이 솟아오른 성주청을 가리키며 자신이 먼저 앞장섰다. 이번에는 탐라 사람들이 먼저 함성을 내질렀다. 인근 민가에서는 행렬을 보자마자 문부터 닫고 숨죽이는 한편, 성주청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곧장 합류하는 장정들도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 뒤로 사람들의 행렬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성주청으로 가는 동안 어떠한 방해가 없었다. 특히 고려군은 그림자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오히려 더 잠잠해졌다. 해는 중천을 향하는데 인기척은 거의 밤이 깊을 때와 비슷했다. 차가운 바람이 괜히 얼굴을 예리하게 스쳤다. 까마귀의 울음조차 없는 하늘은 덧없이 높았다. 탐라의 하늘이 이처럼 맑았단 말인가. 감상도 잠시, 성주청을 눈앞에 보이는 순간. 내 등골에 찬바람이 깊게 스며들었다. 이마에 식은땀과 다리가 떨리기도 했다. 이 자리는 분명, 영암부사와 고여림 장군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야만 했다. 군영의 흔적은 남았으나 군사와 무기들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함성을 내지르던 사람들도 갑자기 숨죽이더니 경계에 들어갔다. 당찬 기세로 계속 앞장섰던 이문경마저도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눈에 날을 세웠다.
난 얼른 그의 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으나, 뒤에서 어깨를 잡아당겼다. 그자였다, 아까 얘기를 나누다 말았던. 성문에 들어선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건만, 갑자기 나타나서는 말없이 바깥 방향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손가락을 입에 급하게 갖다 댔다. 그사이 이문경은 수하들을 곁으로 불러서 무어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머지 군사와 탐라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주변을 계속 살피는 중이었고. 나의 움직임에 주변에서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길을 비켜준 자도 있었다.
대열의 끄트머리에 닿았을 때,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붙잡았다. 고개만 살짝 뒤로 돌렸더니 성주청 안에서 불화살이 솟아올랐다. 몇 안 되었지만 땅에 닿는 순간 커다란 불길이 솟아났다. 그 주변으로도 금세 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괴성을 내지르며 달아나기 바빴다. 나도 덩달아 몸을 피하면서, 솟아오른 불길 너머에 서 있는 이문경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내게 얼른 피하라고 소리치며 손짓했다. 그와 곁에 있는 군사들은 방패를 머리 위로 들더니 오히려 성주청 문을 향해 돌진하였다. 발뒤꿈치까지 따라오는 불길에 더 이상 그들을 보지 못 한 채 일단 힘껏 달려 나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