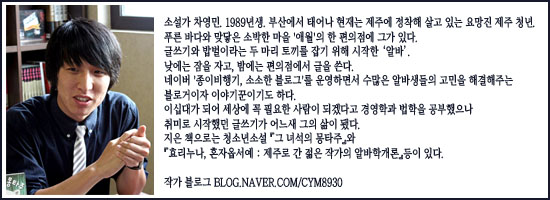차영민 작가 역사장편소설

그들은 성의 북쪽을 노렸다. 아마, 나였어도 그곳을 선택했으리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몽골군 몇과 나를 포함한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어떻게 성주청까지 점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터. 누가 내 뼈를 반으로 부러뜨린다 해도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숨을 거칠게 휘몰아 쉬기에 여념이 없을 뿐.
“뭣하는 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몽골군 대장이 허공에 채찍을 휘둘렀다. 그가 타고 온 말고 혓바닥을 길게 늘어뜨리며 헉헉거리긴 마찬가지였다. 오죽하면 다른 몽골군조차 자신들의 대장을 타이를 지경에 이르렀으니.
결국 이곳에 임시 군영을 꾸렸다. 딱히 군영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삼별초가 사라진 진영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자리만 떡하니 잡았을 뿐. 날이 어둑해졌으나 불은 피우진 않았다. 으스름한 달빛에 의지하여, 그림자만으로 각자 위치를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한숨 돌리고 배를 채웠다. 식량이라고 해봐야, 몽골군이 하루 종일 허리춤에 차고 있던 썩은 것이나 다름 없는 고기 몇 점이었다. 처음엔 목구멍으로 침이 역류하려고 했으나 역한 느낌보다 허기가 더 나를 짓눌렀으므로. 어찌어찌 넘어갔다. 그게 하루 종일 먹은 음식의 전부였으니, 오히려 한 점이라도 더 없을까 싶어 침이 고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놈들은 이미 움직였을 게요.”
몽골군 대장이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고기 한 점을 건넸다. 이번엔 손가락만큼이나 제법 두터운 녀석이었다. 입안에서는 질겅질겅 나무껍질 씹듯 쉽사리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숨을 골랐으니, 부지런히 움직여야겠군.”
순간 사레가 들렸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늦은 밤에 잠은 자야 할 것 아닌가! 싶었으나. 잠시 본능에만 집착하던 나의 아둔함을 지금 오물거리는 고기처럼 씹어서 뱉어내고 싶었다. 아닌 게 아니라, 몽골군 대장이 말한 대로 삼별초는 벌써 움직였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구먼!”
횃불이 줄을 이었는데, 제법 길었다. 불빛과 함께 따라오는 말발굽 소리도 제법 땅을 크게 울렸다. 우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몽골군은 어느새 말에 올라탔다. 우리는 바닥에 잡히는 대로 집어 들고 있는데, 몽골군은 어느새 화살에 불까지 붙이고 있었다. 금세 불화살은 어둠을 뚫고 삼별초가 있는 방향으로 높이 그리고 재빠르게 나아갔다. 땅을 울리던 진동이 잠시 멈추었다.
“우리가 저놈들을 유인할 터이니.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그쪽으로 향하시오.”
몽골군 대장이 내게 칼을 던져주었다. 전투 때 사용하던 것은 아니었으나 제법 길고 묵직했다. 그쪽이라 하면, 생각나는 건 성의 북쪽 뿐이었다. 여기서 뭘 어떻게 가란 말인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몽골군은 삼별초의 횃불 대열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였다.
“뭐하시오, 빨리 우리도 움직입시다.”
어두워서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사람들 중 하나가 뒤에서 내 팔을 툭 쳤다. 여기서 아는 길은 없으나, 일단 몽골군이 나아간 방향과 달리 잡고 나아갔다. 이 와중에 달빛은 참 밝았다. 멀리까진 아니어도 일단 눈앞에 길 정도는 충분히 비춰주고 있었다. 조금 더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나아가자, 우리가 지나왔던 저만치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말이 울었고, 칼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단 나 혼자만이 들은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 낯선 길 어딘가로 계속 밟고 또 밟았다. 뒤에서 누군가, 길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냐 스치듯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턴가 탐라에서는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한참을 달리듯 움직였다. 그리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저 앞에 조금은 멀긴 해도 성이 보였다. 성주청이 있는 그 성 말이다.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어렴풋하게 코끝을 간질였다. 얼핏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물론 이건 나 혼자만이 들은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풀숲에 기대어 거칠게 터져나오는 숨소리조차 억지로 심어 삼키고 있었다.
“오랑캐 놈들이 어디서 보자고 합디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랑캐, 하긴 우리한테는 대원제국이든 몽골이든 그저 오랑캐일 뿐이다. 물론 그런 존재에게 우리의 왕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현실은 신하된 도리로서 허망할 지경이지만.
몽골군 대장이 접선을 요청한 건, 성의 북쪽. 산을 향한 게 아니라 바다를 향한 북쪽이었다. 여기서 보이는 남쪽의 정반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얼핏 보아도 성으로 가는 길목 구석구석에 횃불들이 듬성듬성 자리를 잡았다. 승냥이처럼 재빠르게 피하거나, 몽골군이 그랬듯 시원하게 깨부수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삼별초의 눈을 피하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바다는커녕 성 근처에도 못 가겠는데!”
누군가 혼잣말처럼 함께한 사람이 모두 다 들리도록 중얼거렸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지금은 달빛뿐이지만 날이 새면, 여기서는 우리의 정체가 금방 드러날 게 뻔하였다. 방법은 오로지 성만 바라보고 가는 수밖에.
달은 점점 기울어졌다. 눈앞에 길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가는 길목 근처에 세워둔 삼별초의 군영들의 시선을 가려주는 역할이기도 했다. 첫 번째 맞닥뜨린 군영은 절벽처럼 솟아오른 바위 아래로 슬금슬금 천천히 그리고 재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분명 우리 쪽에 지키는 군사가 있었지만. 아예 우리의 정체를 눈치 채지 못 했다. 그리고 다음 군영이 다다를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향했으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길이 막히고 만 것.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길 자체가 군영을 통과하지 않으면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거기다가 군영을 지키는 군사들의 숫자도 전혀 적지 않았다. 보아하니, 성에 가기 전 마지막 군영인 듯싶었다. 일단 나무 뒤에 몸을 숨겼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갈 텐데.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뱉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