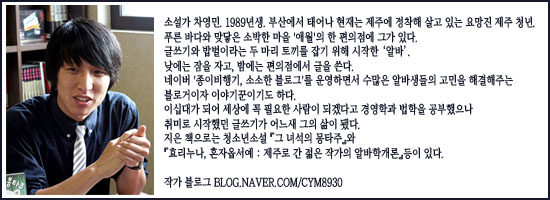차영민 소설가. 역사장편소설.

김방경 옆에서 웃는 자는 바로 홍다구였다. 몽골군의 장수, 하지만 고려 사람이었다. 물론 본인은 극구 부인하겠지만. 조정에서 그의 아비는 한 번씩 거론되곤 했다.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안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물론 그의 아비는 나라를 팔아먹은 짓을 죽음으로 사죄 당하였으나.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홍다구는 아니었다. 오히려 몽골군에 절대 충성하여, 결국 고려가 복종할 상황까지 일조한 건 사실이었다. 진도에서 삼별초가 세운 왕을 처단한 자이기도 했다. 물론 반군이었지만, 고려 왕실의 일원이었다. 들은 얘기만 해도 누구한테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인무도했지만 부디 부풀려진 소문이길 바랄 뿐이다. 그의 등장에 내 주변을 술렁거렸다. 김방경을 따르던 고려군들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홍다구는 한껏 웃으면서 자신의 칼을 빼내고 있었다. 일부러 김방경의 목에 갖다 대는 시늉까지 했으나. 그저 다들 시선만 다른 데로 돌리기 급급했다.
“잔당들 처리하겠다고 여기까지 발걸음하게 만드시나. 안 그래?”
그의 칼끝은 김방경이 입은 갑옷을 툭툭 건드렸다. 순간, 눈빛에 날을 세우긴 했으나 이내 애써 웃음으로 뒤바꾸는 김방경이었다. 몽골군 쪽에서는 은근슬쩍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고려군사들은 모두 얼굴이 시뻘게졌지만 딱 그것뿐이었다.
“황제께서 좋은 소식을 기다릴 테니. 서두르자고. 뭐해, 안 가고.”
그는 칼끝으로 아예 김방경의 어깨를 밀어내기도 했다. 순간, 말이 움직이면서 그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으나. 양팔로 그를 붙잡아준 건, 김방경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진군할 때가 아니라는 말도 넌지시 덧붙였다. 하지만 홍다구는 고개를 내저었다.
“먼저 가겠다고 할 땐 언제고. 갑자기 이럼 못 쓰지, 안 그러신가?”
분명 그 말은 맞았다. 김방경이 몽골군보다 서둘렀던 건 맞았으나, 정작 함께 가는 것에서는 머뭇거렸다. 무엇 때문일지, 이때까지만 해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린 건, 홍다구였다. 그의 손짓에 몽골군과 고려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팔이 울리고 땅은 군사들의 움직임만큼 흔들렸다. 그 속에 나도 있었다. 함께한 탐라 사람들은 일부러 몽골군과 가까운 쪽에 자리를 잡기도 했다. 여차하면, 저쪽으로 옮겨보겠다는 대비책이었다.
행군 대열은 제법 길었다. 선봉에 선 김방경과 가까운 데 있는 내가 뒤돌아봤을 때.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살아남은 탐라 사람들을 다 모아도 이 정도는 될까 싶을 정도였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대열은 더더욱 길어지는 느낌이었다. 심지어 저 끝에서 따라붙은 먹구름조차도 합류한 듯 자연스럽게 한 줄로 이어졌다.
어느새, 삼별초의 성 앞까지 다다랐다. 언덕만 오르면 김통정과 추종자들이 보일 것이다. 남은 군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성은 얼마나 쌓아올렸을까? 괜히 그곳에서 보고 들었던 탐라 사람들이 떠올랐다.
“진군하라!”
김통정의 손짓에 고려군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함성은 몽골군 쪽에서 더 크게 냈으나 언덕을 앞에 두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언덕을 오르는 건, 오직 고려 군사들 뿐이었다. 그중에 나도 함께였고.
넓게 펼쳐진 고려 군사들은 들짐승 못지않게 날쌨다. 돌부리나 작은 나무 정도는 가볍게 밟고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탐라 사람들의 움직임이 굼뜨다 못해 거의 올라갈 기미가 없었다. 내가 그들보다 높은 데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었으니.
금방 토성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탐라 사람들의 삼별초에 끌려가 만든, 외성이었다. 높이가 못 보던 사이, 장정 여럿을 세워도 넘지 못할 정도로 올려놓았다. 외성 중간 즈음에 작은 문이 있었지만. 누구도 지키는 이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밀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따라붙은 부장들은 그냥 성을 오르라고 했으나. 높으면서도 경사가 매우 가팔랐다. 어떠한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래도 군사 몇몇씩 모여 오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어째 이상했다. 왜 저 성 너머에서 어떤 반응도 없을까? 사람이 있긴 한 걸까? 의문에 빠지려던 바로 그때. 성벽 너머에서 화살이 솟구쳤다. 그리고 성벽 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누군지 제대로 확인도 하기 전에 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냥 던지는 돌뿐만 아니라,
큰 돌을 흙과 짚으로 엮어서 아예 굴리기까지 했다. 일단 피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 않았으나 쏟아지는 양이 적지 않았다. 몇몇 군사들이 그 돌에 맞거나 깔려서 쓰러지기 시작했다. 다시 전열을 정비한 군사들이 화살을 쏘아올리고 창도 던져보았지만. 성벽은 높았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으니 화살은 그냥 박히기만 했을 뿐. 삼별초 중 누구도 쓰러뜨리기는커녕 맞히지도 못 했다.
각자 나무든 돌이든 어디든 몸을 숨기기 바빴고, 결국 퇴각 신호가 울렸다. 물러나려고 했을 그때, 몽골군사들이 오히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숨은 우리 쪽으로 오더니 발길질과 주먹질로 같이 달려가자고 끌고 가기도 했다. 일단 나도 몽골군사의 손에 이끌려 성벽 앞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삼별초가 아니라. 그저 주변 마을에서 데려올 법한 노인, 여인 그리고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밀어냈다. 그 모습을 본 몽골군은 침착하게 자리 잡고 화살로 한 명씩 맞혀냈다. 내 앞에 예닐곱 살 되는 아이가 떨어졌고. 눈도 감지 못 한 채 서서히 식어갔다. 그나마 떨어져서 숨이라도 붙어있을라치면 몽골군이 가차 없이 도끼든 칼이든 창이든 휘둘렀다.
그 모습에 고려군은 주춤거렸고, 조금씩 물러나는 기세까지 보였다. 성벽에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으나, 쏟아지는 돌과 화살은 줄어들지 않았다. 몽골군도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 한 채, 그들의 퇴각 신호에 맞춰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 사이 고려군은 더 많이 쓰러졌고 퇴각하는 동안에도 몇몇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나마 난 몽골군의 발걸음에 맞춰 변을 피했을 뿐이었다.
“어찌 그리 무능할 수 있단 말인가!”
홍다구는 돌아온 군사들에게 칼을 겨누었다. 김방경은 말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다시 진격하라는 명을 내리자, 김방경이 손을 내저었다.
“저 성벽은 그리 쉽게 넘을 것이 아닙니다.”
단호했다. 말투며, 홍다구를 쳐다보는 눈빛이. 몽골군사들도 모두 침묵을 지킬 만큼. 홍다구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칼끝을 김방경의 목에 정확히 겨누었다.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정확히 홍다구 옆에 말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