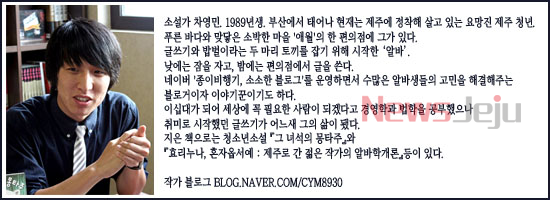차영민 작가의 역사장편소설

바람이 바뀌었다. 언뜻 느끼기엔 조금 전과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건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람만큼은 아니었다. 성벽을 등에 지고 우리 쪽으로 향하는 제법 무거운 바람이었다.
“때가 되었다.”
김방경이 칼을 빼들었다. 곧바로 진군을 명하였다. 그와 동시에 성벽 위로 삼별초 군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적지 않은 수였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사방으로 포진해 있는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김방경은 눈 한 번 끔뻑이지 않았다. 고려군의 움직임에 소란스러워진 건, 몽골군 진영이었다. 그쪽에서 군사 하나가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왔다.
“대, 장군께서, 오시라 명, 하, 셨사옵, 니다, 같이 가, 시지요.”
몽골군 부장이었다. 그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 한 채 손짓부터 내밀었다. 그러자 김방경은 칼을 빼들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다시 몸을 일으키려는 그를, 수하들에게 얼른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게금 안내하라고 일렀다. 다시 고려군은 전열을 정비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몽골군은 뒤로 한 채 성벽과 점점 가까워지자, 삼별초의 모습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 장군!”
김방경의 곁을 가까이 지키던 부장이 멈칫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성벽 위를 지키는 자들은 분명 가득했으나 그중 제대로 움직이는 이는 몇 되지 않았다. 대부분 갑옷만 갖춰 입힌 송장이었다. 눈부터 시작해서 얼굴은 뼈를 드러낼 만큼 바짝 말라있었고, 피부는 거멓게 썩은 듯 짙어 있었다. 그중에 몇은 움직이긴 했으나, 무기는커녕 자신이 입은 갑옷에 짓눌러 몸부림치는 수준이었다. 그게 단순히 멀리서 보이겐 어그적어그적 왔다갔다 하는 걸음일 뿐이지만, 조금만 더 다가가니 달랐다. 어떻게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옥죄는 쇠덩이를 떼어내려는 절규였다.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했으나, 또 다른 멀쩡한 군사들이 억지로 일으켜 세우기 일쑤였다.
좀처럼 의도를 알 수 없는 배치였다. 죽은 자, 거의 죽은 자, 그중 살아 있는 자들. 이들을 돌파해서 들어가야 하는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 주변을 감싸는 공기가 무거워졌다. 성문은 분명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것은 말 그대로 꽉 닫아서만 아니었다. 이 공간을 채우는 우리의 숨결이었다.
“성문을 열어라!”
김방경이 칼을 높이 치들었다. 고려군은 함성과 함께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성벽 위에서는 화살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창도 떨어졌다. 저곳을 지키는 이들 중 몇몇의 책임감 내지 최소한의 움직임일지 모른다. 고려군이 성문을 두드리는 순간까지 그들의 화살은 아무런 위력이 없었다. 바람은 분명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으나, 어찌 된 것이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일부러 고려군을 피해가는 듯 화살은 무력하게 종잇장처럼 바닥에 툭툭 떨어졌다. 그러나 성문은 바로 열리진 않았다. 지형이 협소한 탓에 충차를 따로 가져오지 못 한 터라, 성문을 강제로 부술 무기는 없었다. 오로지 군사들의 힘이 성문을 밀어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조금도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도끼로 내리 찍어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다. 성벽을 타고 올라갈 사다리도 없었다. 군사 중 몇몇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려 했으나,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높았고 구조상 절반 이상을 올라가기 힘들었다. 뒤에서 힘을 조금 보태고 있는 나로선, 삼별초 저들이 스스로 열지 않는 이상 딱히 방법은 없었다. 성벽에서 움직이는 삼별초 군사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그 사이 고려군은 점점 힘이 빠져 나가고, 전열도 점점 흐트러지고 말았다.
“어찌 문 하나를 못 연단 말인가!”
김방경이 수하의 도끼를 빼앗아 직접 성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도끼가 부러져 날이 바닥에 내리 꽂히고 만 것. 분명 나무와 철을 섞어서 만든 성문이건만 좀처럼 허물어질 기미가 없었다. 결국 성문에 기름을 내리 부었다. 불을 내지른 채 일단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 사이 몽골군이 고려군 뒤로 바짝 따라 붙어서 전열을 다듬었다. 홍다구가 직접 군사 몇몇을 이끌고 김방경 앞으로 다가왔다.
“고려 놈들은 문 하나 부수질 못 하는 건가!”
김방경은 붉게 달아오른 홍다구를 외면하였다. 그러자 홍다구 곁을 지키던 몽골군은 화살로 성벽 위에 서 있던 삼별초 몇몇을 쏘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걸 주워다가 김방경 앞으로 가져왔다.
“송장도 못 쓰러뜨리는 게, 어찌 군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홍다구는 바닥에 내려오더니, 삼별초의 시신을 발로 몇 차례 짓밟았다. 얼굴은 완전히 바스라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고 주변에 썩은 내가 갑자기 확 풍기고 말았다. 자신의 수하를 시켜, 떨어뜨린 삼별초 군사들의 시신을 고려군이 피워낸 불길에 내다던졌다. 김방경의 얼굴은 검게 물들었다. 자신의 칼을 꽉 쥐면서 떨고 있었다.
“어찌 송장을 가져와서 해괴한 짓을 벌이는 거요?”
“네놈이 직접 두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라, 저놈들의 행동을.”
성벽에 움직이는 삼별초 군사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바람에 쓰러지는 모습들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성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불길은 점점 하늘로 치솟아 완전히 성문을 가리고 말았다.
김방경과 홍다구는 마주 보며 말을 아꼈다. 대신 각자 쥔 칼은 손에서 힘껏 쥐고 있었다. 몽골군은 고려군 사이사이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성벽 너머로는 조용함을 너머 고요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우리는 무얼 위해 저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걸까? 모두 같은 의문을 가슴에 품었겠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다. 나를 포함해서.
불길만 바라보던 적막함을 깨뜨린 건, 빠르게 다치는 말발굽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고려군의 부장이었다. 일부러 먼저 보내어 주변 상황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장군, 김통정이 달아났사옵니다.”
그가 오자마자 내뱉은 말이었다. 그 역시도 성문을 넘진 못 했으나, 성벽을 따라 주변을 둘러보고 왔다. 그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삼별초의 주력 부대였다. 그중에는 김통정이 분명 있을 거란, 추측이었다.
“얼마나 믿을만한 정보더냐?”“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느냐?”
“성 뒤에 있는 산이옵니다.”
“우릴 안내하거라.”
김통정의 말고삐를 당기기 무섭게, 홍다구가 가로막았다.
“뭣 하는 건가, 군사들을 함부로 물리겠다는 건가?”
“적장이 달아났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다.”
“확인해봐야겠습니다.”“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다.”
“제 수하가 보고 온 사실입니다.”
“정 가겠다면, 혼자 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지요.”
김통정은 망설임이 없었다. 대신 혼자가 아니라, 몇몇을 지목하여 따르게끔 하였는데, 그중 나도 포함이 되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일단 확실한 건 확인해봐야 김방경의 말을 따를 뿐이었다. 그를 내려다 보는 홍다구의 옅은 미소가 지금으로선 더욱더 알 수 없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