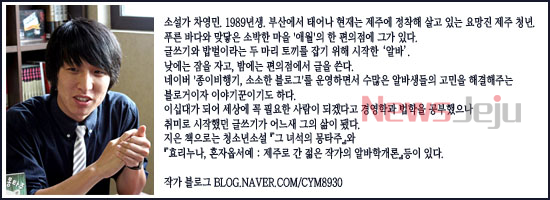몸을 다시 일으켰다. 땅은 계속 내 발을 붙잡았다. 아마 느꼈을 것이다. 발을 떼는 순간, 내 목숨줄이 더 빠르게 끊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멈출 순 없었다.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이 땅은 수 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끊어질 것이 분명했다. 어디든, 누구든 상관없다. 보고 듣는 대로 무엇이든 담아내야만 한다. 축 늘어지는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걷는 동안 목은 계속 말랐다. 땅에 고인 물들은 보이는대로 마셨다. 그러나 좀처럼 타들어가는 목을 달랠 수가 없었다. 하다못해 걷다가 보이는 풀들도 일단 한주먹씩 뜯어먹기도 했다. 빠져나가는 힘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나무 아래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다. 무겁게 내리앉는 눈꺼풀은 의지만큼 붙들지 못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햇볕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뿌옇게 흐려진 눈을 몇 번 비볐다. 선명해진 주변에는 별다른 게 들어오지 않았다. 곳곳에 봉긋하게 솟아오는 작은 오름들, 저 멀리 어렴풋하게 드러난 바다.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몇몇 짐승들이 잔뜩 경계하는 눈빛과 함께 내 앞을 지나쳤을 뿐이다. 몸을 일으켰다. 이상하리만큼 갈증은 싹 사라지고 말았다. 물론 입술과 혀끝은 바짝 말랐지만 그것과 달리 목구멍은 축축할 정도였다. 일단 바다 쪽을 걸어가는 동안 발도 한결 가벼워졌다. 당장 달릴 수야 없겠다만, 그렇다고 제 풀에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다. 해가 중천을 넘어설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코 끝에 비린내가 스칠 때쯤, 그제야 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밤, 눈이 감길 때까지 그토록 고대했던 지슬과 탐라 백성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몽골 군사들이었다. 나도 그들을 보았으니, 그들이 나를 발견하는 건 당연한 이치일 터. 채 방향을 돌릴 새도 없이 저들 중 몇몇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딱히 몸을 숨기거나 머리를 바닥에 댈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쩌면 조금 전 보았단 짐승들의 눈빛이 더 푸근했다고 할까나. 내 쪽으로 사정없이 달려드는 저들은 필히 인간의 탈을 쓴 또 다른 짐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것도 잠시, 딴 생각으로 넘어갈 겨를도 없이 저들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머리채를 붙잡힌 채, 도축한 짐승마냥 끌려서 멈춘 곳은 군영의 한가운데였다. 그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다가오더니 한참 내 얼굴을 살폈다. 일단 나도 저 얼굴은 초면이었다. 얼굴 형태부터 빛깔, 무엇보다 목소리가 일단 고려 사람은 아니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다만 고려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터라,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고려에서 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나도 모르게 한참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돌아오는 건, 매섭게 내 뺨을 후려치는 그의 손바닥이었다.
“어째서 나를 노려보는 건가.”
그저 보았을 뿐이다. 그의 물음에 달리 대답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그가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을 전혀 꺼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곁을 지키던 군사들도 뒤로 물리고 있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잠시 내려다보던 그는 직접 내 팔와 목을 묶은 줄도 풀어주기에 이르렀다. 귀에 자신의 얼굴을 슬쩍 갖다댔다.
“왜 아직 돌아가지 않은 건가.”
다시 한 번 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가 돌아가야 하는 걸 안단 말인가. 나도 모르게 기침이 터져나왔고, 무슨 말이든 내뱉어야 했으나 그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다. 정신을 거의 잃을 지경이었으나 다시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자를 당장 바다에 내던져라! 아니다, 내가 직접해야겠다.”
뒷덜미를 붙잡아 일으키더니 난데없이 끌고 가기 시작했다. 방금 맞은 손길에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었다. 일단 그의 손에 질질 끌려나갔고, 어느덧 인근 바닷가까지 다다랐다. 그는 수하들을 셋만 대동하였다. 주변을 슬쩍 살피던 그는 갑자기 나를 바로 세워주는 게 아니던가.
“조정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소.”
말투부터가 달라졌다. 주변을 상당히 경계하는 듯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는 거의 나만 겨우 들을 수 있을만큼 나지막했다.
“묻지 말고, 날이 저물면 배를 보내줄 터이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시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조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분명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어째서 자신을 밝히지 않는 것이며, 배를 따로 불러가면서 떠나게끔 한단 말인가. 입을 열려고 할 때, 그가 난데없이 주먹으로 내 배를 깊숙하게 후려쳤다. 칼을 들더니 곧장 겨드랑이쯤을 쑤셨다. 살짝 따끔할 뿐 살을 파고들진 않았다. 그럼에도 바닥엔 피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절대 이곳을 벗어나선 안 되오. 누구에게도 들키지도 마시오.”
그가 내게서 떨어지기 직전 다급하게 속삭였다. 바닥에 다시 쓰러지듯 엎드렸고 그의 손짓에 맞춰 눈을 슬쩍 감은 척을 했다. 함께 온 몽골 군사들이 내게 다가오려고 했으나, 그가 손으로 막아내며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왔던 곳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중 한 군사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으나, 그의 손길에 이끌려 돌아갔던 길을 멈추진 않았다. 바닷물이 허리춤을 적셨지만 난 거의 죽은 듯 가만히 엎드려있었다. 일단 그가 일러주었던 날이 저물 때 오는 배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것일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