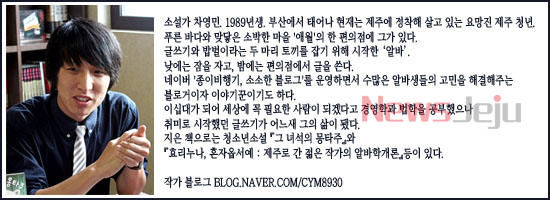차영민 작가의 역사 장편소설

김통정, 그가 떠난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과연 후손들은 어떻게 그를 기억해낼까? 나의 미약한 기억이 기록으로 상세히 남길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손에 붓을 놓을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싶었으나 기록할 수 있는 오로지 나의 두 눈과 온몸의 감각뿐이었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왜곡되고, 감각은 나도 모르게 무뎌질 뿐이다. 생생한 지금의 순간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바람이 차다. 이 또한 훗날 어떻게 기억해낼지 모를 일이다. 탐라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아왔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한 것들을 봐야만 할까? 발길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았다. 그러나 움직여야만 한다. 멈춰있는 동안에도 탐라는 계속 일이 벌어질 테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 지슬이 데려다준 잠시 머물렀던 은신처. 파도에 흔적조차 볼 수 없었지만 그곳엔 지슬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떵 된 거꽈?”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벌써 김통정과 만났던 순간의 기억이 살짝살짝 희미해지려고도 한다. 애써 미소를 머금은 채, 여전히 내리누르는 통증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몸을 일으켜야만 했다. 바람은 거세었고 파도는 계속 우리 쪽을 집어삼킬 기세로 몰아쳤다.
“가게마씀.”
한 발 한 발 바다와 멀어지다 보니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졌다. 낯선 마을이 눈앞에 보였다. 사람들도 어렴풋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애써 피하려는 기미가 역력했다. 어디라도 들어가볼라치면 사람들이 몸을 숨기지 바빴고, 어떤 이는 작은 돌을 내던지기도 했다. 알 수 없는 말로 소리를 내지르기도 했다. 마을 한가운데까지 들어왔고, 사방이 집으로 둘러싸였지만 우리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다. 당장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없었으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주변에 하나둘 인기척이 늘어나는 건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이곳을 피해야겠다, 지슬에게 속삭였다.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으로선 갈만한 곳도 마땅찮다는 것이다. 날이 어두워진 것도 있었지만, 고려군이든 혹시 모를 삼별초 잔당이든 또 다른 누군가가 숨어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하물며 몽골군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더더욱 생사를 알 수 없을 지경일지도. 그렇다고 여기도 그리 안전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내리깔린 골목에서 뭐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아니, 정확하게 우리를 향하는 날카로운 눈빛들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기다렸다는 듯 사방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순간, 지슬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에 내 귓속으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어떵 이디까정 왐신고.”
낮게 내리깔린 목소리가 바람을 갈랐다. 바로 앞에 몸집이 제법 우람한 노인이 바짝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날을 바짝 세운 돌이 들려 있었다. 따라온 나머지 사내들도 마찬가지로 손에 날을 세운 것들을 돌이든 나무든 힘껏 쥔 상태였다. 지슬이 입을 열었다. 나름대로 한참 얘기를 털어놓았지만 그들의 눈빛에 세워진 날은 조금 더 무뎌지지 않았다. 손바닥에 땀만 더 흘러내릴 뿐이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고목이라도 된 듯 어디든 움직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어떵 ᄒᆞᆯ 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답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여기서 어떻게든 머무르게 해달라거나, 당장 떠나야겠다는 두 가지. 지슬은 내 생각과 같은 내용으로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러나 주변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완벽히 알아들을 순 없었으나 노인과 주변 몇몇 사람들이 말들을 조합해보면, 이곳은 삼별초가 한때 잠시 머물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협조해줬다고 했으나 돌아온 건, 더 많은 요구였을뿐. 마을의 청년들은 갑작스럽게 성벽 공사에 동원시켰고 그중에 일부는 군사로 편입하여 데려가기 일쑤였다. 잠깐 이야기를 들으며 주변을 살펴보니, 젊은 사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노인이거나 여인과 아이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삼별초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외부인인 셈이다.
“어떵 ᄒᆞᆯ 거라!”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다. 우리가 왔던 방향이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 지슬의 얼굴을 보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먼저 발을 떼었다. 나도 함께 움직였다. 한 발 한 발 우리가 떠난 자리엔 마을 사람들이 바짝 붙어서 채워나갔다. 눈앞은 어두웠고 양쪽은 뜨거웠다. 마을로 나가는 마지막집을 스치는 순간, 등에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고개를 슬쩍 돌려보니, 아이의 얼굴이 어렴풋하게 드러났다. 눈가가 촉촉했고, 온몸은 파르르 떨고 있었다. 계속 보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다시 앞만 보고 나아갔다. 바람은 우리를 막아내고 있었지만 뒤편은 저들이 막아서고 있었다. 딱히 방도는 없었다. 계속 더 나아가려는데, 저 멀리 횃불이 보였다. 땅이 울렸고, 말 울음소리도 뒤섞였다. 지슬과 나는 얼른 옆에 바위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다. 순식간에 군사들이 우리 눈앞을 지나고 있었다. 조금 전 나왔던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다시 군사들을 살펴보니, 다름 아닌 몽골군이었다. 그들이 들어간 마을에서는 비명이 쏟아져나왔다. 노인, 여인, 아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비교할 수 없었다. 어둠으로만 가득했던 곳곳에 불길이 솟아났다.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으나 지슬이 급히 잡아당겼다.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으랴, 온몸을 떨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고마이이십써. 경허어야 살아지주.”
지슬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말았다. 마을에 불길은 점점 높게 치솟았다. 비명 속에 간간이 묻어나온 웃음소리가 내 눈가를 달아오르게 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