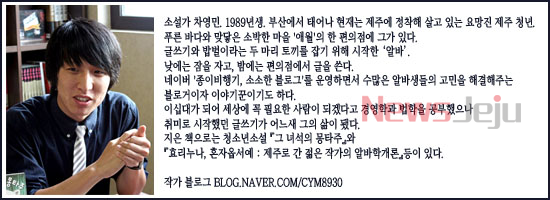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점점 솟구치던 불길은 검은 연기로 바뀌어갔고, 비명도 힘을 잃어갔다. 지슬은 내 팔을 꽉 붙들었다. 그러나 몸이 움직였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최소한 몸을 숨긴 여기만큼은 아니었다. 지슬의 팔을 밀어내고 일어났다. 검은 연기가 치솟는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갔다.
마을은 초입부터 탄내와 피비린내가 뒤섞였다. 사방에 말발굽소리와 함께 질질 끌려가는 소리로 분주했다. 조금 더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힘을 잃어가는 비명이 들렸다.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간 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차마 더 이상 다가갈 수는 없었다. 집안 곳곳에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나와 눈을 마주친 노인은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곧장 발길을 돌릴 틈도 없이 눈앞에 그들이 막아섰다.
“너도 이 마을 사람인가?”
가운데에 선 몽골 군사가 칼을 겨누었다. 그의 허리춤엔 눈도 채 감지 못한 노인들의 머리가 장신구처럼 달려 있었다. 다른 군사들은 마을 여인이나 아이들을 짐짝처럼 자신의 말에 걸쳐놓은 상태였다. 일단 내 소속부터 밝혔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 것도 풀어 놓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어쩌면 내게 겨운 칼보다 예리해서 당장 무엇이라도 베어낼 것만 같았다. 이미 내 목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잘려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기서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지. 네놈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나의 차분한 응답에 대한 최대한 예를 갖춘 또 다른 답변이었다. 더 이상 물어보는 부분도 없었다. 당장 칼이 목을 도려내진 않았으나 손목이 굵은 줄에 묶이고 말았다. 내 말을 믿고 싶다 해도 일단 자신들의 진지에 가서 확실히 확인하겠다는 것. 묶이지 않더라도 얌전히 따르겠다는 말은 오히려 손목을 더 조이기만 했다. 순간, 내가 이곳을 왜 돌아왔는가 의문스러웠다. 딱히 그 상황에서 어디로 갈 곳도 없긴 했다. 이래나저래나 그들을 직접 마주쳐야하는 건 기정사실이었다. 다만 지슬이 조금 더 몸을 숨겨서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랄 뿐.
몽골군은 마을을 구석구석 다 살폈다. 졸지에 졸졸 따르면서, 나처럼 묶인 자들과 그 자리에서 쓰러진 자들을 봐야 했다. 대부분 노인들은 이들의 칼을 피할 수 없었다. 젊은이들도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내뿜으면 역시 차갑게 쓰러뜨리기 일쑤였다. 모든 결정과 행동은 순식간이었다. 어쩌면 조금 전 나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은 엄청난 인내심이었던 걸까?
“장군께서 기다리겠군. 돌아가자.”
마을 곳곳에 피워낸 불길이 대부분 사그라질 때쯤, 철수를 시작했다. 나처럼 줄에 묶여 끌려나온 이들은 어림잡아 열댓 정도. 유일하게 나만이 사내였고, 대부분은 젊은 여인네였다.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눈물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조금 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여인 하나가 줄도 끊기고 목도 달아났으니. 나조차도 숨소리 하나 내뱉는 게 괜스레 조심스러웠다. 특히 내 손목을 묶은 줄은 점점 더 조여오기만 햇다. 마을 바깥으로 나가려던 순간, 돌멩이 하나가 바람을 재빠르게 파고들었다. 몽골 군사가 타던 말의 엉덩이에 부딪히고 떨어졌다. 말은 갑자기 앞발을 들고 몸부림치더니 기어이 군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가 붙잡던 줄에 묶인 여인들도 덩달아 넘어져서 뒤엉키고 말았다.
“기습인가?”
군사들이 주변을 경계했지만 더 이상의 돌멩이는 날아들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앞에 작은 그림자가 드러났다. 바로 지슬과 함께 마을을 나올 때 돌멩이를 던졌던 그 아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손에 또 다른 돌멩이를 쥐고 있었다.
“다 모사불켜이!”
아이의 외침은 군사들이 든 칼보다 더욱더 예리했다. 다른 여인들이 얼른 숨으라고 소리쳤으나, 아이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남은 손에 있는 돌멩이를 던졌으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말에 뛰어내린 또 다른 군사가 아이의 뒷덜미를 붙잡고 번쩍 들었다. 불빛에 비춘 아이는 그림자보다 더 작고 가냘펐다. 얼굴에 살집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옷은 거의 낡아서 속살이 다 비출 정도였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만큼은 어른 못지않게, 여느 군사들 못지않게 살기가 바짝 올라와 있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구만. 싹을 완전히 밟아야지. 안 그런가?”
몽골 군사가 칼로 아이의 목을 내리치려던 순간, 내가 온몸으로 달려들었다. 아이를 들었던 군사는 넘어졌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져 몇 번 구르더니 재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넘어졌던 군사가 몸을 일으키더니, 곧장 발로 내 얼굴을 걷어찼다. 손목을 묶은 줄이 팽팽해지더니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네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눈앞에 칼날이 재빠르게 내려왔다. 그러나 그걸 막은 건, 또 다른 군사였다.
“이 자는 고려의 군사다. 우리가 함부로 해하여선 안 될 것이야.”
처음 나와 대화를 나누었던 군사였다. 그러나 넘어졌던 군사는 잠시 멈칫했으나 다시 칼을 내게 휘두르려고 했다. 눈을 질끈 감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칼 소리가 먼저 나타났다. 내게 칼을 들었던 군사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동시에 그가 끌고 왔던 마을 사람들도 함께 칼로 쓰러뜨렸다.
“전장 한복판에서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대원제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함께하던 몽골군사들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딱 그뿐이었다. 쓰러진 군사를 돌아보지도 않은 그는 다시 길을 재촉하였다. 오히려 내가 쓰러진 군사를 뒤돌아서 살펴볼 지경에 이르렀다. 시야에서 가까울 때까지만 해도 숨이 붙은 듯했으나 점점 멀어질수록 움직임은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고서도 저들은 아무런 말도 내뱉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조금 뒤처지는 듯하면 줄을 바짝 당기는 게 전부였다. 지슬과 숨었던 장소를 지나칠 때 주변을 슬쩍 둘러봤지만 인기척도 없었다. 지슬은 어디로 간 걸까? 이와중에 완전히 사라진 그 마을 속 아이가 떠올랐다. 그 아이는 지금쯤 어디에 있는 걸까?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어떠한 것도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무엇보다 탐라는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 가장 큰 질문이 내 가슴을 조여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