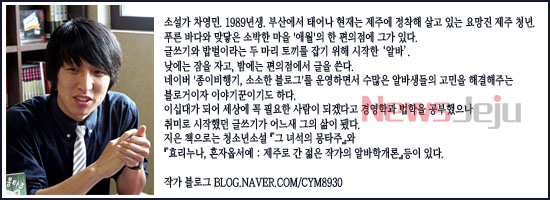바다에 어둠이 드리웠다. 엎드린 내 몸을 적시는 바닷물은 점점 냉기를 거칠게 들이밀었다. 오히려 등뒤로 살포시 스치는 바람이 따스할 정도였다. 마저 눈을 떠보았다. 으스름한 달빛 아래 요동치는 물결만 드러날 뿐,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그자는 어째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을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일단 몸을 일으켰다.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주저 앉고 말았다. 몸이 어디 하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다시 반쯤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힘 없이 푹 쓰러지기를 수차례. 손 끝에 거칠거칠한 바위가 잡혔다. 끝이 칼처럼 뾰족하여 살갗을 찢는 듯했으나 딱히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온기에 온몸이 풀릴 정도였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바다와 바위, 나무 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벌레와 짐승 들의 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오로지 발등에서 잔잔하게 부서지는 물결만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소음이었다.
여기선 또 무엇을 해야할까, 무엇이든 생각해내야만 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기도 망설여졌다. 중간에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다. 정말 그가 말했던 배는 오긴 오는 걸까,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달이 조금 전보다는 선명했다. 마치 바다를 모두 집어삼킬 듯이. 이대로라면 나를 데려갈 것만 같았다. 점점 머릿속이 흐릿해지던 그 순간,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드러났다.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저것이 나를 찾아올 그들인가!
바위 뒤로 몸을 옮겼다. 살짝 웅크린 채 얼굴만 바다 쪽으로 내밀었다. 물결은 여전히 잔잔했고 희미한 그림자는 점점 배의 형체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점차 사람도 몇몇 보였고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도 눈에 점점 들어왔다. 다시 한 번 더 눈에 힘을 주었다. 그림자는 물살을 걷어내고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배는 그리 크지 않았다. 대여섯 명 정도의 형체가 보였고, 그마저도 꽉 차보였다. 깃발은 고려군의 것이었다.
“여기가 맞는가?”
배에서 사내 하나가 내렸다. 그 뒤를 나머지가 뒤따랐는데, 서서히 드러나는 형체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언뜻 보면 가까운 강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 비슷했다. 최소한 옷차림새는 그랬다. 그러나 몸집은 딱 그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어부들이 어지간한 군사들보다 몸집이 컸고, 움직임도 일사분란했다. 주변을 경계하면서 나름대로 대열을 짓는 것이, 보통은 아니었다.
나는 계속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바로 근처까지 다가와도 섣불리 그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는 터. 최대한 숨도 내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하찮은 바람일뿐. 그들의 눈길이 어느새 내게로 몰렸다.
“혹시, 고려로 떠나려고 하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바로 앞에서 서 있는 건 알 수 없었다. 고개를 서서히 들었다. 말을 걸었던 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다. 구면이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분명한 건 조정에서 스치듯이라도 만났다. 어쩌면 말을 섞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얼굴이 많이 상했소.”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넘어온 따뜻한 손길을 거절할 도리를 몰랐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축했고, 곧장 배로 향했다.
“당장 돌아갈 것이오.”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었다. 돛이 올라갔고, 배가 서서히 움직였다. 사람들이 챙겨준 음식을 입에 구겨 넣었다. 목에 걸려서 잠시 숨이 넘어갈 정도로. 뭐든 넣어야만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어째서 여태 탐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오.”
다시 그가 물었다. 아무리 얼굴을 올려다보아도 누군지 알 순 없었다. 그는 분명 나를 아는 듯했다. 물어보고 싶었다. 도대체 누가 여기를 알고 보낸 것이냐고. 차마 입이 떨어지진 않았다.
“자세한 얘긴 가면서 나누고, 눈을 붙이시게.”
덮을 거리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눈을 붙일 순 없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무엇이 있을지 모를 상황이 아니던가. 잠시 웅크려 있다가 몸을 일으켰다. 모두의 시선이 모였다. 배는 계속 바람을 따라 섬과 멀어지고 있었다. 배가 떠났던 곳의 형체가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섬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림자를. 이대로 저 그림자를 두고 떠날 순 없었다. 나를 데려온 자에게 다가갔다. 어깨를 붙잡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배를 돌려주시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