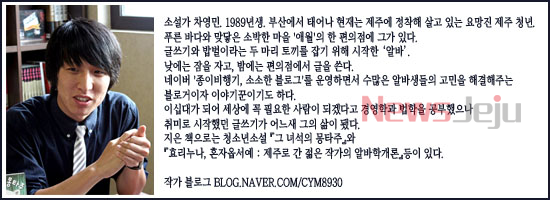차영민 작가의 역사장편소설

배가 멈추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시 말해보시오. 배를 돌리라고?”
주변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모였다. 거구의 사내 하나가 뒤에서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다가왔다. 대뜸 내 목덜미를 잡는 게 아니던가. 다른 사람들이 그의 팔을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었다. 목은 한껏 조여왔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네놈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목을 조이던 손에도 힘이 서서히 풀렸다. 당장 완전히 덮칠 것만 같던 몸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단순히 배를 돌릴 문제는 아닐세.”
나를 데려온 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어깨에 손을 얹더니 뱃머리 쪽으로 이끌었다. 눈앞에 펼쳐진 파도는 잔잔했다. 그러나 바람의 결은 차가웠다.
“우린 자네를 구하러 온 게 아닐세.”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러나 시선을 맞추진 않고 애써 앞에 펼쳐진 잔잔한 파도만 바라보았다. 주변은 침묵이 어둠보다 더 짙게 드리웠다. 그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길 잘 들으시오.”
배에 있는 그들은 폐하께서 친히 보낸 것이었다. 그림자처럼 은밀히 움직이는 자들인데, 다른 곳에 알리지 말아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 자들이었다. 조정에 있을 때 어렴풋이 그런 자들이 있다고만 들었을 뿐, 실체는 알 수 없었다. 저들을 어떻게 불리는지도 알 수 없었다. 굳이 따로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어떻게든 조정에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동료들을 바다에서 잃었소.”
그리 튼튼하지도 넓지도 않은 배로 탐라까지 오느라, 평탄하지는 않았을 터. 그럼에도 끝까지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조정은 몽골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나라로서 기틀을 유지하되, 원하는 땅이 많다는 것. 그중 하나가 바로 탐라였다. 다른 곳보다 탐라만큼은 고려와 완전히 분리되고, 오히려 몽골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폐하께선 탐라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십니다.”
그렇다. 탐라를 잃는다는 건, 바다를 통째로 내어주는 것과 같았다. 이는 고려 조정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한 사실이었다. 어쩌면 삼별초 세력이 탐라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본토보다 더 넓은 바다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내가 돌아가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긴 해야 했다. 여기로 보낸 장인어른도 기다릴 테고, 그 너머로 폐하도 소식을 알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고개를 내저었다.
“누구도 우리의 움직임을 알아채선 아니되오. 돌아갈 기회는 지금 아니면 없소이다.”
그가 내 목에 칼을 겨누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저 칼이 조금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대신 그의 입에서 조금 더 내막을 들을 수 있었다. 몽골은 단순히 고려만 차지하려는 게 아니다. 바다 건너 섬들을 정복할 계획까지 세워둔 터. 경로는 경상도를 거쳐 바다로 나아가겠지만, 탐라야말로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할 게 뻔했다.
무엇보다 조정의 근심은 탐라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고려가 완전히 저들에게 넘어간다는 것. 당장은 나라로서 기반은 운영할 테지만 탐라를 빼앗기면 고립된 섬과 다름이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려면 탐라를 빼앗기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다.
탐라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할 터, 누구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정의 신하들은 문무관을 막론하고 폐하가 아닌 다른 곳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 전달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탐라는 삼별초의 저항이 극심하고 고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폐하에게 올라간 보고였다. 삼별초 저들이 몽골에 끝까지 맞선 건 맞으나, 그건 정녕 고려의 안위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 실제로 그들의 세력보다는 탐라 백성들의 피가 이 땅에서 온통 흩뿌려졌다. 고려군과 삼별초, 몽골군이 이 땅을 완전히 유린할 때도 저들이 직접 손 댄 것은 극히 적었다. 주민들 중 누군가라도 붙잡고 방패막이 삼아 앞세우고, 서로 편을 나누어 피를 보게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탐라의 실상이었다.
“그러니 하루 빨리 가서 고하셔야 합니다. 폐하가 갈등하고 있소이다.”
그렇다. 하루라도 빨리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을 고하여야 할 텐데. 마음이 걸렸다. 누가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것인가.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자만이 모든 걸 소상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당장 배를 돌리라고. 탐라에 있는 그를 개경으로 데려가야만 한다. 몽골군이 그를 찾아내기 전까지 말이다.
바람이 분다, 탐라를 향해서. 물결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배를 조금씩 탐라 쪽으로 서서히 밀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몇 번이건 배를 돌렸다. 이번만큼은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른다. 배에 있는 자들이 나와 뜻을 함께해준다면, 탐라와 고려를 온전히 지켜낼 기회가 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 뱃머리가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내 옆에 선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마지막 회항이오. 우리 모두의 목숨을 걸고.”
처음 탐라에 닿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천천히 나아갔다. 무엇도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