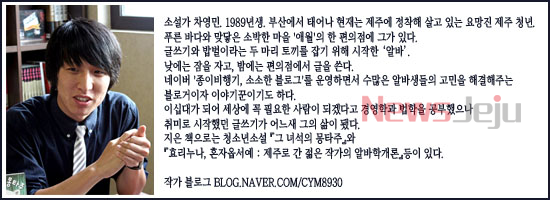차영민 작가의 역사장편소설

다시 탐라로 돌아왔다. 완전히 떠난 바 없었으니, 땅에서 발만 뗀 셈이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데리러 온 자들은 어쨌든 그냥은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내 의지대로 왔으니, 다시 돌아갈 상황이 되면 그들의 뜻을 따르자는 조건이 붙었다.
“바람이 참 맑구려.”
나를 데려온 자가 옆으로 다가왔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머금기 시작했다. 그를 따라온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눈만 끔뻑일 뿐이었다.
“그래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하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탐라를 떠나면 안 된다는 목소리만이 귓가에 계속 머물렀다. 이를 누가 알아주리오. 저 멀리 산쪽으로 올려다보았다. 어둠에 뒤덮여 형체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곳으로 가야 한다고.
“저곳에 무엇이 있소?”
그가 물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인 그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처음엔 선뜻 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다. 한참 나를 보던 눈동자가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다.
“혹여 그를 말하는 것이오?”
높아지는 그의 목소리에 난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내게로 집중된 시선은 좀처럼 거두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산으로 향한 나의 눈을 거둘 수 없었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다. 바다를 건너지 못 했다면, 분명 저곳 어딘가에 있을 터. 개경에 반드시 그를 데려가야만 했다. 그래야 탐라를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바람이 불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발걸음을 막아내는 것만 같았다. 저 산 어디에 그가 있을지는 모를 일이었다. 그저 나를 믿고 함께 걷는 이들에게 민망스러운 마음일뿐.
“그자가 과연 순순히 우릴 따르겠소?”
나도 자신은 없었다. 혹여나 만난다 해도 어찌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탐라를 은밀히 벗어나 개경으로 동행도 역시 만만치 않을 터.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대의 충정이 부디 헛되질 않길 바라오.”
그가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기 시작했다. 초행일 터인데, 제법 나아가는 모양새가 당찼다. 그를 따르는 다른 이들도 함께 힘을 냈다. 물론 나를 향한 눈초리는 여전히 날이 바짝 서 있었다. 그저 난 산만 바라보며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게 최선의 대답일뿐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저놈들은!”
점점 어둠이 옅어지고 있을 떄, 저 멀리 낯선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 수가 상당했고, 덩달아 말울음 소리에 여인들의 소리도 섞여 있었다. 잠시 멈추어 각자 흩어져 나무나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았다. 몽골군이 탐라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나가는 것을. 주먹을 꽉 쥐였지 그렇다고 벌떡 일어날 순 없었다. 다만 보여주고 싶었다. 탐라의 지금 상황을.
“어찌 허망한 일이!”
어쩌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나는 데려가야 한다. 이곳을 끝까지 지키려고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던 그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마을부터 지나쳐야만 했다. 빙 돌아가서 가기엔 이미 우린 너무 마을과 가까이 자리를 잡았다.
“어찌할 셈이오?”
한 차례 거센 바람이 지나가면 고요가 찾아온다. 눈앞의 마을은 고요를 코앞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저곳에서 들려오는 괴성은 너무나도 높이 치솟았다. 주변에 눈빛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절대 몸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했으나, 그들은 하나둘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는 참을 수 없소이다.”
살짝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바로 머리 위에 화살 한 대가 날아들었다. 모두 재빠르게 몸을 낮췄지만 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땅은 울렸고, 저들이 목소리는 더욱더 선명했다. 방금 소리를 냈던 이는 숨었던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머지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저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와 가까운 곳에 숨은 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른 이들 중 몇몇은 이미 칼자루에 손을 얹기까지. 다시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 닥쳐왔다. 과연 그들은 몇이나 될 것인가. 우리는 이곳을 통과해서 산으로 무사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은 저 산만이 대답해줄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