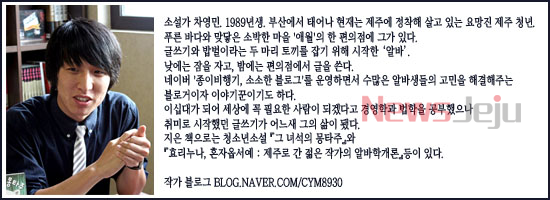그들의 눈빛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말 그대로 눈앞에 이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쓰러뜨릴 수도 없을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쉬이 길을 내줄 분위기도 아니었다.
“우리를 찾아온 자들은 모두 내치기에만 급급했소.”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뒤에서 목소리를 냈다. 그에 나머지 사람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순식간에 웅성거렸다. 점점 우리와 거리를 좁혀나갔다. 내 곁에 선 자들 중 한 사람이 칼을 빼드려고 했으나, 재빨리 손으로 막아냈다. 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저들은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 할 것이라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난 알 수 있었다. 행여나 해칠 생각이었자면 이토록 아주 가까운 곳에 가만히 두고 놔둘 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저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조정에서 왔고, 어떻게든 탐라를 지켜야겠다고. 물론 저들도 선뜻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 하는 눈치였다. 지금 상황에서는 삼별초는 와해됐고, 연합군이 탐라를 장악한 것은 틀림없었다. 다만 김통정의 행방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 가장 걸릴 뿐. 행여 그가 온전히 살아있다 하더라도, 다시 세력을 되살리긴 힘들 것이다. 탐라까지는 어찌어찌 남은 세력을 이끌었고, 나름대로 고려 남부 해안 지역까지 장악했겠으나 그것이 한계였다. 다시 힘을 모으기엔, 탐라 백성들의 마음을 저버린 것은 분명했다.
“삼별초도 물러났는데, 누구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려는 거요?”
조금 전 한마디 내뱉었던 마을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입술이 메말랐다. 함께한 자들의 얼굴을 한 번씩 살펴보았다. 고려군도 이들도 모두 전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긴, 전하께서 보내신 이들 중 한쪽은 완전히 불신해야만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고려군에 몸을 담으며 보아왔던 김방경의 의중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었다. 그리고 말했다. 고려군은 탐라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모여들었다. 물론 감히 김방경의 몇 가지 행동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단지 이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조정에 반역한 자들을 처단할 토벌군에 가까운 모습들만 보였다. 간혹 탐라 백성들의 안위에 대해 물었을 때, 어떠한 것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할 일을 마치면 하루 빨리 이 땅에서 물러나야만 할 터. 그렇다면 누가 이곳을 지켜준단 말인가. 삼별초는 세력이 완전히 섬멸당했고, 고려군도 물러난다면, 남은 건 몽골이다.
물론 몽골이 우리 고려를 완전히 취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탐라는 얘기가 다르다. 몽골은 바다를 원했다. 정확하게는 바다 너머의 영토들을 갖길 원했다. 저들에게 없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를 품은 바로 탐라임은 틀림없다. 설령 지금 내 생각처럼 탐라가 몽골로 넘어간다면, 우리 고려는 바다를 잃은 것이다. 탐라보다 더 고립된 섬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를 터. 일개 말단 관리가 감히 조정과 전하의 계획까지 살펴볼 순 없겠으나. 직접 탐라에 머무른 결과, 고려는 반드시 이 땅을 지켜내야만 했다. 당장은 몽골에 완전히 고개를 숙여야겠지만 세상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바다만큼은 우리가 직접 가져야만 했다. 여전히 전하의 의중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 탐라를 절대 포기해서 안 될, 명분 말이다.
“허튼소리를 계속 내뱉으면 가만둘 수 없소이다.”
“전하를 능멸해선 안 될 것이오.”
양옆으로 살기가 올라왔다. 그럼에도 말을 멈출 순 없었다. 저들도 알아야만 한다.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려는 존재들을. 다시 한 번 말했다. 몽골은 탐라를 원하고, 바다를 원한다고.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은 건, 노인 셋. 그들은 눈을 지그시 감은채 고개를 위로 치켜들었다.
“애초부터 주인 아닌 자들이 주인 행세를 해왔는데, 누구라도 어떠하랴.”
그중 한 사람이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그럼에도 나머지 사람들이 급히 자리를 떠난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당신들이 찾은 자, 어디에 있을지 알 것도 같소만.”
“정녕 찾아야겠는지.”
“이 자리에 온 자체가 그대들에게 운명이겠지요.”
세 노인은 번갈아가며 한마디씩 내놓았다. 그리고 가운데에 선 자는 굽은 허리를 서서히 펴더니 손짓으로 이끌었다. 나머지 두 노인은 양옆으로 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몇 발자국 걷다가 오른쪽에 선 노인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이냐고.
“이미 그대들이 이정표는 알 것이오. 다만 우린 헤매지 않도록 방향만 알려줄뿐.”
“그곳에서 분명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오.”
두 노인이 또다시 한마디씩 보탰다. 나는 제대로 알아들었으나, 나머지는 탐라에서 사용하는 말이 익숙치 않아 좀처럼 못 알아듣는 눈치였다. 노인들의 말을 이해한다고 조용히 전달해주었다.
먼저 앞장선 노인을 따라 마을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점점 마을과 멀어지고 집들의 형체가 희미해지려고 할 때, 갑자기 마을 한가운데서 붉은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시오. 결국 우리가 선택한 일이니.”
노인은 발길을 재촉했다. 잠시 멈춘 나에게 다가와선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탐라를 살리고자 한다면, 절대 멈춰선 안 될 것이오. 조금 더 가서, 원하는 자를 꼭 만아야 할 것이오. 어서!”
순간, 노인의 목소리에서도 아주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눈빛 자체도 완전히 어깨를 짓누를 정도였다. 다시 한 번 발을 떼고 점점 우거지는 숲길 따라 걷기 시작했다. 과연 이곳만 지나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