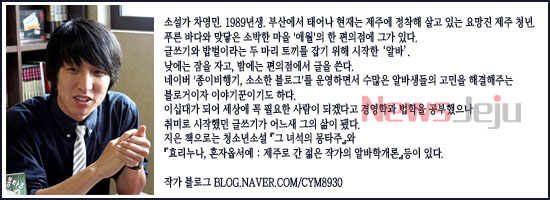밝아오는 구멍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쩌면 여기서 정말 목숨줄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생사의 기로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지만, 이번엔 그 결이 달랐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으나 지금 상황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생각을 하면 아니 될 걸세.”
침묵을 지키던 김통정의 입이 열렸다. 생각이라고 해봐야, 안 되겠다는 확신뿐이었다. 그렇다고 팔다리가 묶여 머리 위로 내리쬐는 약간의 빛만 있는 상태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딱히 없었다. 귀를 최대한 열어보고 싶었으나 나와 김통정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적막함 그뿐이었다. 손끝이 떨려왔다. 우리의 정체를 알고 있으나, 자신들은 전혀 드러내지 않은 의문의 존재들. 세상을 떠난다치더라도 알아야 허망하지 않을 터. 목숨의 연명보다 더 갈급한 건,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자들에 대한 의문이었다. 정말 이대로 무력하게 육체와 머릿속을 완전히 비워내야만 하는 것일까.
“지금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뿐일세.”
그의 바람과 달리 생각에 다시 빠지려던 차에, 묶였던 손이 가벼워졌다. 눈앞엔 어느새 발을 묶은 줄도 풀어내는 그의 정수리가 가까이 있었다. 어떻게 풀어냈는지 물어볼 새도 없었다. 잠시 말을 듣지 않는 다리를 주먹으로 두드렸다. 몸을 완전히 일으켰지만, 머리 위에 구멍은 상당히 높았다. 팔을 힘껏 위로 뻗어도 끝에 닿지 않았다. 우리를 둘러싼 사방의 벽을 두드려보았다. 흙이 조금 흘러나올 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돌 그 자체였다.
“자네 어깨를 빌려주게나.”
김통정은 이미 주변을 두드리더니, 나를 한가운데에 세웠다. 순식간에 다리와 어깨를 발로 밟고 올라섰다. 짓누르는 힘이 너무 버거웠다. 나도 모르게 다리를 휘청거렸다.
“참게!”
그의 짧은 목소리에 순간 돌이 된 듯 굳어버렸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 어깨가 찢어질 듯하면서 다시 주저앉으려고 할 때 몸이 가벼워졌다.
“다시 일어서시게!”
위로 올려다보자, 그의 손이 내게로 향하였다.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도 좀처럼 구멍 바깥으로 나간 그가 내민 손끝과 닿지 않았다. 크게 숨을 들이미시고 발끝에 힘주어 높이 뛰어올랐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다. 허공에 휘저은 팔은 바닥으로 추락하듯 먼저 떨어졌다.
“잠시 기다리시게.”
그의 목소리가 구멍 밖에서 희미하게 멀어졌다. 얼마 뒤, 갑자기 괴성과 발소리가 이어지더니 갑자기 다시 주변이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눈이 부실 듯 내리쬐던 밝은 기운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어느새 어둠이 드리웠다. 머리 위의 구멍과 사방의 벽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나와 밖으로 나간 김통정은 과연 목숨 마저도 갈라진 운명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지금 나를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려 하는가. 이제는 개경으로 가서 해야 할 일들조차 까맣게 칠해지고 말았다. 모든 시간들의 흔적들은 내 몸 구석구석 선명하건만, 어디든 갈 수 없는 신세라니. 어쩌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정체불명 그 자들이 다시 돌아오길 빌어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다 두고 누구 하나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까.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은 잊은 지 오래. 그저 암흑처럼 목을 조여오는 의문만이 내가 살아있단 주요한 증거 하나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차갑게 올라오는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서서히 머리를 뒤로 뉘여 구멍 밖의 약간의 다른 암흑을 올려다보았다. 눈을 스르르 감으려던 순간, 얼굴에 흙이 떨어졌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킬 새도 없이 다시 한 번 더 흙이 쏟아지듯 내려왔다. 얼른 옆으로 몸을 피하자, 이젠 큰 돌들도 쏟아졌다. 거의 발앞까지 구른 돌들은 하나둘의 수준이 아니었다. 순간, 내 귀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몰라도 말하는 소리 역시 함께였다. 위를 올려다볼 새가 없었다. 당장 쏟아지는 것들을 애써 피하는 게 당장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다가 뾰족한 돌을 밟고 고꾸라지긴 했으나, 그조차도 다시 쏟아지는 흙에 일단 몸부터 피하기 바빴다. 그사이 사람들의 소리가 가까워졌고, 구멍의 윤곽이 눈앞으로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몸을 웅크리던 차에 다시 손이 안으로 내려왔다.
“어서 잡으시게!”
익숙한 목소리였다. 누군지 확신하기도 전에 일단 손을 뻗었다. 당기는 힘이 느껴지기 무섭게 바깥으로 빠르게 몸이 빠져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뒤덮기가 무섭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내 앞으로 다가온 것은 다름 아닌 김통정이었다.
“고생하셨다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낯선 자 여럿이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그것도 하나둘이 아닌 상당히 적지 않은 수였다. 그들은 모두 그와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였다. 도대체 이들은 또 누구란 말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