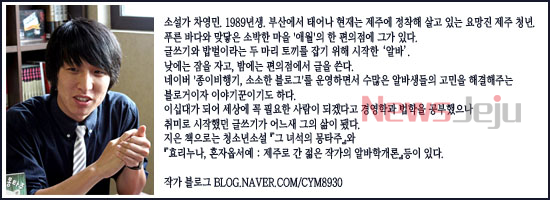차영민 작가의 역사장편소설

잃어버렸다고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이 땅은 잠시 저들의 짓밟혔지만,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처럼 다시금 솟아난다. 비록 꽃이 되지 못 하더라도 뿌리채 뽑히지 않을 저들의 움직임이 하나둘 피어올랐다.
“갈 곳은 없다. 가야만 한다.”
김통정이 사람들 앞에 섰다. 바람은 그의 곁을 맴돌며 주변의 쓰러진 꽃부터 일으켜 세웠다. 나도 그의 앞으로 다가가 자리를 잡고 섰다. 양옆에는 같은 바람에 일어난 사람들이 그가 그랬듯 온전히 몸을 내맡겼다. 이윽고 바람이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바로 그곳이었다. 성, 우리가 직접 쌓아올리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바로 그곳 말이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알고 있다. 그와 나, 이곳에 함께한 사람들 모두. 선택은 없다, 이대로 나아가는 수밖에.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눈앞에 우리가 세웠고 빼앗긴 성벽이 있다. 저곳을 넘어야 한다. 산처럼 높게 쌓아 올린 흙으로 두른 성벽은 이름 모를 풀로 무성했다. 언뜻 멀리서 보았다면 풍광이 좋을 작은 산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저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이 차갑게 묻혔는지, 직접 쌓아 올리지 못 한 이들은 절대 모를 것이다. 초록잎 가득한 구석구석에 드러나는 검붉은 피의 비린내를 살아서 기억하는 이도 역시나 몇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함께 죽음과 맞섰던 이들을 아직 기억한다.”
김통정이 성벽에 다가가 꽃을 꺾어다 자신의 품속으로 넣었다. 이상하게도 성벽 위로는 어떠한 인기척도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칼바람와 함께 눈발이 날려 이곳을 지킬 군사들도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수십 명이 성벽에 가까이 붙었는데도 누구 하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가. 나도 그렇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두리번거리기 일쑤였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건, 바로 김통정이었다.
“들어가자.”
마치 자신의 처소로 향하듯 성문을 그대로 밀었다. 성벽 못지않게 높은 성문은 그의 손에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잇따라 몇몇 사람들이 함께 그와 함께 성문을 밀어냈다. 바닥에서 흙먼지가 한가득 올라오고, 상당한 굉음이 올라왔지만 활짝 열린 성문 너머로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저 멀리 성의 모습만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을 뿐이었다. 다만 성벽 안쪽으로는 부러진 창대와 화살이 상당했다. 깨진 투구와 갑옷, 찢어진 의복도 바람에 휘날렸다. 냄새가 더욱더 진하게 풍겨왔다.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진한 피비린내가.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인다. 하늘에서는 까만 새들이 무리 지어 둥글게 빙빙 날아다녔다. 바람이 찬바닥을 내리꽂는 소리보다 저들이 내는 울음이 내 귀에 깊게 박혔다.
“바람이 차다, 얼른 가자.”
김통정은 다시 앞장서서 나아갔다.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 힘을 제법 실었다. 어깨를 쫙 편 뒷모습은 처음 봤던 그때의 기개와 거의 흡사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처음 보았던 삼별초 군사들이 내품었던 힘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걸음이 느려지는 건, 바로 나였다. 과연 이대로 나아가도 괜찮은 건가?
또다시 성벽과 마주쳤다. 흙으로 높게 쌓아 올린 외성과 달리 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내성. 이곳 역시 많은 피들이 뜨겁게 솟구쳐 차갑게 식어버렸다. 성벽을 이룬 돌들 하나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더 진하다면, 지금 내 코를 스치는 피비린내와 마찬가지리라. 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야 할 터인데, 성벽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각의 지붕 한가운데 설치된 현판도 오른쪽이 떨어져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모양새였다. 성문도 반쯤 열린 상태에서 바람이 흙먼지를 안으로 집어넣었다.
“저, 장군, 어째 좀 이상하지 않소?”
성문 앞으로 나아가는 김통정을 그 곁에 있는 이가 막아 세웠다. 누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쉽게 문이 열리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 역시도 의문스러움이 가시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없을 것이야.”
그는 잠시 멈췄던 발을 다시 움직였다. 가장 먼저 성문을 밀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둘씩 들어갔고, 성밖에 남은 건 다름 아닌 나 혼자였다. 성 안의 모습은 궁금하면서도 자신이 없었다. 적막함이 성벽보다 더 높게 쌓인 성벽 너머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뒤돌아설 자신은 더더욱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이제 한 발 내딛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