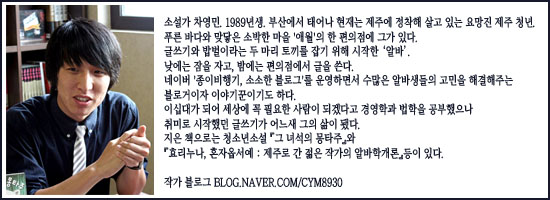차영민 역사장편소설

분명 같은 바람에 맞서는 상황이건만. 내가 탄 배는 좀처럼 나아가질 않았다. 오히려 뒤로 점점 밀리기까지 했다. 그 사이, 탐라 쪽에서 나타난 배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조금씩 모습이 드러났는데,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삼별초.
어떠한 신호도 없이 무조건 배를 바짝 붙이더니, 거의 닿으려고 하니 그쪽에서 사람들이 뛰어서 넘어왔다. 무작정 우리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칼부터 들이미는 게 아니던가? 선장은 재빨리 두 손부터 들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배에 사람들은 모두 두 팔이 묶이고 말았다. 갑판 한가운데에 모아두고서야 책임자로 보이는, 아마 일개 부장일 듯한 사람이 느릿느릿 천천히 넘어왔다.
“어딜 급히 뱃머리를 돌리는 게냐?”
애써 개경 말투를 쓰는 듯했으나 난 바로 알아차렸다. 그가 탐라 사람임을. 함께 있는 삼별초 군사들도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랬다. 분명 억양은 탐라였지만 애써 개경 말투로 내뱉으려는 노력이 가득했다.
“아니, 당신은?”
삼별초 군사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탐라에서 지내온 세월이 얼마였던가? 일단 나 혼자만 손에 묶인 줄이 얼른 풀리긴 했으나. 저들의 눈빛까지 완전히 풀어내진 못 했다. 오히려 내게 어딜 도망갈 수작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도망갈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굳이 내려오지 않았을 터. 어찌 그리 생각하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무조건 사람들을 싸잡아놓는 건 누구한테 배운 소행이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더니. 순간, 나를 향한 눈빛이 더 강렬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선장을 비롯해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묶였던 줄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변 공기를 가득 채운 무거운 공기만큼은 좀처럼 떠날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몸만 풀렸을 뿐 호흡까지 조심스러웠다.
“온다는 기별이 전혀 없었는데?”
부장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눈에 힘을 주고 있었으나 미묘하게 흔들렸다. 거기다가 손바닥을 허리춤으로 연거푸 닦아내는 눈에 계속 들어왔다. 그 주변에 있던 삼별초 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거칠게 우리를 붙잡고 묶기까지 했건만. 어찌 모양새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딜 가려던 작정이었소?”
거기다가 말투도 한층 나긋나긋해졌다. 오히려 공손함에 가까웠고, 두 손은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기까지했다. 오히려 내가 되물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답은 않고 타고 왔던 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던가? 그래서 그의 팔을 붙잡았다.
“행여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 우린 처음 본 겁니다.”
앞뒤 설명없이 막연한 대답이었다. 정말로 온전히 우리를 그대로 둔 채, 삼별초는 뱃머리를 돌리고 말았다.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선장도 잠시 한숨 돌리더니 돛으로 다가갔다. 다시 개경으로 향하자고 했으나, 내가 고개를 내저었다. 분명 김통정은 수하들에게 내 정체를 소상히 밝히고, 행여 만나더라도 어떻게 할지 말했을 터. 오히려 그냥 놓아주는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지금 탐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대로 개경으로 향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선장에게 다시 뱃머리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조금 전 삼별초에게 능멸을 당했던 선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상태로 갔다가 영영 못 나올 거 같다는 얘기였다. 그렇다고 이대로 진짜 돌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외딴 곳이어도 좋으니 탐라 어디든 잠깐 내려주기만 해달라고 청하였다. 다행히 고려군사들도 나와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그들도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을 터. 어쩌면 탐라에 숨은 아군이 있을 거란 막연한 얘기도 내뱉었다.
그리하여 선장은 다시 뱃머리를 돌렸다. 대신 탐라의 서쪽으로 향하였다.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파도는 거칠었지만 배는 멈출 줄 모르고 거세게 나아갔다. 기이한 모양의 암석들이 쭉 늘어뜨린 그 끝에 조그마한 포구 하나가 보였다. 그곳엔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아주 작은 고깃배 하나만 물결에 따라 흔들리는 중이었다.
“난 저기 잠깐 세웠다가 돌아갈 거요. 아시겠소?”
선장의 두 눈은 바다를 향하였다. 배가 포구에 가까워지자, 짐만 간단하게 챙긴 채 땅으로 내려왔다. 모두 내린 걸 확인한 선장은 곧장 뱃머리를 돌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지는 배를 바라보는 동안, 우리 뒤에는 낯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햇볕에 가려 그림자만 선명했는데 숫자가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몇 발자국 다가가니까 조금씩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반 삼별초나 군사들은 아니었다. 노인과 몇몇의 젊은이, 아이들까지 딱 봐도 이 일대 마을 사람들로 보였다. 그런데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던 건, 그들의 손에 돌이 쥐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노인부터 겨우 걸음마만 뗀 거 같은 어린아이까지. 모두 같은 날을 바짝 세운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살짝 언덕 위에 있던 터라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었다. 뒤에는 포구와 바다 뿐이었고 어디로든 피해 갈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봐야 허약한 자들입니다. 바로 돌파하시지요.”
고려군사 중 한 사람이 그리 말하였다. 나머지 고려군사들도 이견이 없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선뜻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조금만 지켜보고 가능하다면 얘기라도 나눠보자고 했다. 그러나 고려군사들은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발을 떼고 말았다. 마을 사람으로 보이는 그들에게 달려가는 동안, 예상대로 돌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건, 돌이 정면만이 아니라 양옆에서도 쏟아져 나왔던 것. 그제야 미처 발견하지 못 한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다. 제아무리 힘 없는 어린아이가 던져도, 돌은 돌. 고려군사들은 대차게 달려나갔다가 낙엽처럼 허무하게 쓰러지기 시작했다. 급히 몸을 돌린 자들에게도 돌은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달려나간 모든 자들을 쓰러뜨린 후에야 돌멩이는 멈추었다. 난 그때까지 멈춰 선 곳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드러낼 수 없었다. 돌이 된 듯 가만히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서 있었으나. 그렇다고 저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었다. 쓰러진 고려군사들을 지르밟고 나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난 얼른 어깨에 멘 짐들을 풀어놓고 양팔부터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저들의 돌멩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아이가 기합과 함께 나를 향해 돌을 내던졌다. 물론 내 앞까지도 미치지 못 했으나, 그다음 돌멩이들도 금방 날아들 기세였다. 이대로는 있다가는 앞서 쓰러진 고려군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게 뻔하였다. 저들은 분명 탐라 사람들일 터.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다.
“펜, 펜안허우꽈!”
그 순간,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저들의 손에서 저절로 떨어진 돌들 말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