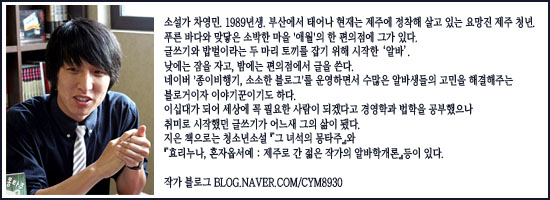차영민 역사장편소설

바로 그였다. 수장을 자처하며 어느 순간부터 여기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 시작한, 바로 그. 가만 생각해 보니,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원래 무얼했던 자였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나 말고 누구도 그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던 건 삼별초 군사들의 발길질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자체였다. 그것만 해도 당장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란 희뿌연 믿음 하나가 짙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얘기는 익히 들었소이다, 조정에서 왔다고?”
그는 애써 예스러운 말투였다. 탐라말을 해도 된다 했건만, 본인도 고풍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서 목소리에 한껏 힘을 주었다. 그보다 나를 따로 불러낸 것은, 조정에서 삼별초를 토벌하러 내려올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병력은 얼마나 되며, 탐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차마 내가 답할 수 없을 내용들이었다.
대답 대신 오히려 질문을 내던졌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탐라 사람들을 주동하는지. 생각보다 그 답은 간단했다. 살아야하니까, 딱 그뿐이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사라지는 이곳에서 언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지 모를 일이긴 했다. 그 살아야한다는 이유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확실히 움직일 힘이 있었다. 지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마시던 물을 기꺼이 내어주며, ‘조금만 더 힘내서 살아냅시다’는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까지 힘을 북돋아 주었다.
최소한 뒤에서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특별한 계획 없이 막연하게 토성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제아무리 높게 성벽을 쌓는다 한들, 고도로 훈련된 군사들이 이걸 기꺼이 못 넘을 텐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따로 물어보았으나,
“성벽만 단단히 하면 감히 넘보지 못 할 게요.”
그의 대답조차 막연하였다. 설령 성벽이 높고 단단해서 삼별초 군사들이 감히 넘지 못 한다면, 그걸로 모두 해결이 될 문제인가? 당장 여기 주변에서 식량을 구하기 쉽지 않을 터, 아직은 남아있는 식량이 떨어진다면 누군가는 성벽 너머로 다녀와야 할 일이었다. 그걸 삼별초에서 가만히 놔둘 것인가?
굳이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진 않았으나, 내 머릿속에 맴도는 근심은 어느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과 달리 성벽은 점점 더디게 올라갔고 밤사이 도망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도 했다. 걸핏하면 곳곳에서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는 건 일상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 와중에 그는 오로지 성벽만 빨리 올려야한다며 사람들을 재촉했다. 부탁도 했고, 어떤 사람들하고는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처음엔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였으나, 점차 진정한 이유가 드러났으니.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
여기까지 끌려 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며, 집이며, 마을이며 모든 걸 잃은 상태였다. 제 한 목숨 근근이 이어간다는 건, 어찌 보면 자기 의지와 무관한 것이라. 나처럼 숱하게 생사기로에 놓였고, 오히려 죽음보다 더한 고통들을 겪어왔겠지만. 그 목숨이라는 게, 쇠심줄보다 질기고 또 질긴 것이라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나마 숨이라도 크게 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픈 마음에 여기서 차마 떠나지 못 한 자들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야말로 이미 세상을 떠나도 열댓 번 더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터. 스스로 마음을 몇 번씩이나 비웠건만, 여전히 난 여기서 숨 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사람들도 조금씩 떠나갔지만, 남은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성벽을 조금씩 쌓아갔다. 손에서 흙과 생채기가 아예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그만큼 성벽은 점점 더 단단해져갔다. 그때쯤 여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그동안 삼별초는 단 한 번도 다시 여기로 올라오지 않았단 말인가?
그동안 인근 마을에 은밀하게 척후를 내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들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마저도 믿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척후 역할을 해왔다. 결국 두 사람이 아예 작정하고 성안 근처까지 동태를 살펴보고서야 확신했다. 삼별초는 이쪽으로 아예 발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실에 수장을 자처하는 그는, 어깨에 힘이 제법 들어갔다.
“거 보시오, 저놈들도 우릴 무서워한다니까.”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개중에 몇 명은 정말 믿고 싶어하는 시늉만 보였을 뿐. 사방에 두른 거대한 토성은 분명 우리를 감싸고 있었으나, 어찌 보면 숨막히게 가두는 역할도 톡톡히 하였다. 사람들은 제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성벽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을 두드리거나 한숨만 깊이 내쉬었다. 성벽만 높으면 무엇하리, 정작 바깥과 통하는 성문이 문제였다. 주변에서 쓰러진 나무를 몇 개 주워서 성벽 사이를 꽂아 놓은 모양이었다. 한두 사람만 들어갈 정도로 좁게 만들긴 했으나, 누구든 들어오기 어렵지는 않았다. 가만히 놔둬도 바람결에 툭 하고 떨어지기 일쑤니. 성문 곁을 두 사람이 반드시 지키고만 있어야 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 중 나무를 제대로 다루는 이는 하나도 없었으니. 수장을 자처하는 그는, 하루 정도 안절부절못하다가 이내 애써 스스로 위안하기에 이르렀다.
“어차피 좁은 통로니, 함부로 들어올 생각도 못 할 것이오. 높은 성벽만 봐도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소이까?”
그의 물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귀에 모두 들어가긴 했으나 어떠한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 하였다. 더 큰 문제라면 성만 겨우 쌓아놨을 뿐, 그다음은 뭘 해야 할지 어떤 것도 내놓지 못 하였다. 그저 며칠만 기다리면, 사람들이 피신하러 올 것이고 이걸 본 삼별초가 기세에 눌려 물러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 들어왔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직까지는 여기 사람들이 먹을 식량은 있었다. 풍족하진 않으나 하루씩 겨우 죽지 않고 버틸 정도의 양이었다. 또 하나는 당장 삼별초 쪽에서 어떠한 반응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염려가 섞인 기대와 달리,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분명 삼별초를 피해 여기로 피신하는 사람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자고 했으나, 정작 누가 오면 그나마 남은 식량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큰 고민 아닌 고민이었다.
며칠을 막연하게 바깥소식에 대해 기다렸다. 몇몇이 다녀온 소식은 여전히 별것이 없었으나 그것에 안도하며 그날 밤, 잠을 청하는 자가 대부분이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하루에 몇 번씩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한참을 내려오지 않은 그의 뒤를 따랐다.
성벽 위, 여전히 질겅질겅한 흙이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붙들며 버티고 있었다. 그 와중에 잡초들이 여기저기 싹을 틔웠고, 풀꽃도 몇 송이 눈에 들어왔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발이 옆으로 미끄러졌다. 어떤 부분은 흙이 돌과 뒤섞여 한 뭉치씩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는 계속 허둥지둥한 나와 달리 차분히 잘 걸어가고 있었다. 조용히 성안 쪽을 바라보다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젠 내가 어찌해야 좋겠소?”
오랜만이었다, 그가 하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온 것은. 그는 애써 꼿꼿하게 서 있었으나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서 있는 자리에 흙들도 조금씩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끝이 떨리는 모습은 금세 내 눈에 들어왔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앞으로 어찌할 셈이냐고 물었으나 돌아온 건 조용히 바람 따라 내젓는 고갯짓이었다. 그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깊게 한숨을 내쉴 때쯤, 저 멀리서 큰 먼지가 일어나고 있었다. 성안에서 폴폴 올라오는 먼지 속에 그들이 드디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