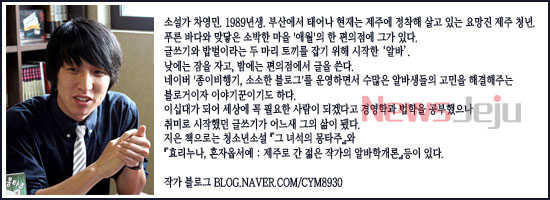그것은 마치 굶주린 맹수의 절규에 가까운 포효였다. 단지 허공에 맴돌다 낙엽처럼 바스라지는 무력함은 아니었다. 김통정의 찢어질 듯 뜨거운 목소리는 주변을 에워싸는 찬공기를 되차게 걷어냈다. 그의 움직임 한 번에 고려군은 하나둘 쓰러졌다. 단단하게 무장한 갑옷도 예리하게 날을 세운 창도 그를 막아낼 수 없었다. 오히려 달려들수록 더 빠르게 쓰러질 뿐이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에게 달려든 고려군 선봉은 모두 높이 자란 풀들 사이로 쓰러져 일어나질 못 했다. 함께 따라온 나머지 군사들도 서로 눈치를 살필 뿐 선뜻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한 발자국씩 나아갔다. 양손 끝에 뚝뚝 떨어지는 피를 닦아낼 기미도 없이 또 한 번 괴성을 내질렀다. 바닥에 꽂혔던 창을 뽑아내자마자 바로 자신의 맞은편으로 힘차게 내던졌다. 화살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바람을 걷어내며 군사 하나를 더 쓰러뜨렸다. 장벽처럼 유지했던 대열이 흐트러지고, 그 사이로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또 한 번 더 달려들었다. 가장 먼저 그의 손에 붙잡힌 군사는 자신이 들고 있던 창을 꽉 붙잡은 채, 목이 사정없이 꺾여 쓰러졌다. 잠시 둥그렇게 그를 둘러싸고 칼과 창의 끝을 겨누었지만 누구도 먼저 휘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둥그렇게 포위된 대열은 조금씩 넓어졌다. 대신 그들 뒤쪽으로 자리 잡은 궁수들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첫발은 분명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그것은 오히려 식어갈 뻔한 뜨거운 포효를 다시 한번 더 깨우는 셈이 되었다. 자신에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지 않았고 온몸으로 걷어냈다. 분명 날카롭게 바람을 가르던 화살들이 그의 기세에 하나둘 꺾이는 게 아니던가. 화살이 날아들 때마다 쓰러지는 건, 그와 가까이 서 있는 고려군이었다. 화살보다 더 빠르게 달려드는 그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막아내지 못 했다. 저것은 맹수를 넘어선 저승에서 넘어선 사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지만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생존해나갔고, 주변 것들의 생명을 하나둘 빼앗아가는 모습. 바위 뒤에 몸을 숨겨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저 정도로 엄청난 자였단 말인가. 강화에서 진도로 자리를 옮기고, 이곳까지 거점을 완전히 이동할 때까지도 조정에서는 그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잔당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삼별초 저들이 이때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저자의 신통한 능력 때문일지도. 분명 탐라 곳곳에 그가 죽었다고 알려졌겠지만 지금은 죽음 그 너머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기세 하나로 주변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 과연 내가 무사히 조정까지 데려갈 수 있을 것인가. 설령 데려간다고 한들, 괜찮을지 염려도 걷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나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두 눈으로 보아온 그의 움직임을 미천한 입으로 내뱉는 말과 쇠약한 손으로 써내려 간 글자로 모두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분명 조정에서도 그의 능력을 가벼이하지 않을 터, 고려가 지금 몽골에 받아온 치욕이 그로 하여금 떨쳐낼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낱 이름 모를 관리가 감히 나라의 운명까지 좌지우지 할 수 없겠다만, 최소한 선택지는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 사라져가는 애꿎은 고려군사들의 목숨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여기서부터 거두어들이는 목숨은 어쩌면 그의 뜨거운 피를 멈추지 못 하게 하리라. 웅크린 몸을 서서히 일으켰다. 저들에게 한 발자국씩 다가갔다.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피 냄새들이 내 주변을 에워쌌다. 그에게 향했던 시선 중 몇몇이 나에게 잠시 돌아오긴 했으나, 칼끝도 함께 돌리진 못 했다. 곳곳에 숨어든 궁수들도 내 쪽으로는 쏟아지지 않았다.
“머, 멈춰주시오.”
그의 움직임이 까만 그림자가 아니라 붉게 타오르는 형태로 드러낼 때, 나도 목소리를 내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휘몰아치던 바람마저도. 거칠게 내뱉은 숨소리들이 귓가에 바짝 다가올 때쯤, 그가 다시 움직였다. 자신에게 향한 창들을 가볍게 툭툭 걷어내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간 곳은 바로 내 앞이었다.
“어째서 달아나지 않는 건가. 죽음이 무섭지 않으신가.”
그의 오른손이 내 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러나 하나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떨리는 건, 그의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를 슬며시 내저었다. 고려군은 목석처럼 서 있는 듯하다가 하나둘씩 자신들이 달려왔던 어둠 속으로 하나둘 몸을 숨기기 시작했다. 마치 이곳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목을 붙잡고 있었다. 몸을 뒤로 내빼지 않았다. 시선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에 힘을 잔뜩 주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래, 자넨 나와 같은 운명이지.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건가.”
그의 주변을 감싸던 뜨거운 기운이 점점 식어갔다. 내 목을 붙잡던 손도 내려놓고 조금 전 포효했던 바다 쪽으로 시선이 돌아갔다. 그제야 등 뒤로 여기까지 함께했던 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을 본 건, 나 혼자 뿐은 아닐 터. 저 바다를 건너야 할 건, 저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움직여야 할 것인가. 바람은 더욱더 강해졌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