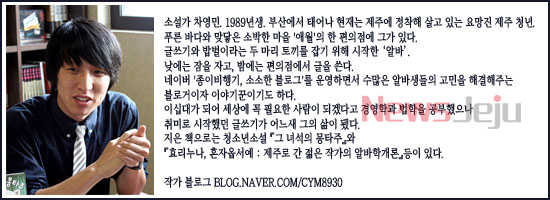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다시 일으켰다. 어둠 너머로 파도 소리가 넘어와 귓가에 맴돌았다. 숨을 깊이 마시고 내뱉었다.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왔구나, 안도의 마음과 함께 드는 것은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허공에 시선을 고정시킨 김통정의 뒤통수만 한참 바라보았다.
“난, 그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네.”
그렇다, 곁에서 나름대로 살펴본 나도 그게 느껴졌다. 그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물론 옳은 결정인지 여부는 감히 내가 판단할 순 없다. 누군가에 역적이겠지만 누군가는 의인으로 기억할 터. 다만 그의 움직임에 너무나도 많은 탐라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바람과 함께 쓰러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조정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잠시 보류하고 그를 다시 만나러 온 것은, 일단 조정과 전하께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 고려를 온전히 싶은 열망이 어디까지 이끌었는지, 그의 눈빛과 표정을 직접 읽히게끔 하고 싶었다. 그 이후 선택은 칼을 쥔 이들이 결정할 문제였다.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섰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의 과정을 소상히 남겨야 할 때라고 했다.
“소상히 남기라는 것은, 역적으로서 모든 것을 자복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다. 자복이 아니라 기록, 그 자체가 중요했다. 고려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이 달랐을 뿐 마음마저도 어긋났다고 할 수 없을 터. 제국을 칭하는 자들의 말발굽이 백성들을 마구 짓밟건만. 이를 어째서 토벌이라는 표현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설령 나의 의지가 윗분들께 오만과 불경함을 넘어 역심으로 보일지언정, 백성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모습마저 완전히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탐라를 눈앞에서 무력하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제국을 칭하는 군사들이 아니라 조정 그 너머 전하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마음이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김통정이 아니라 김통정이 대신 전하는 쓰러진 백성들의 목소리 말이다.
“자네가 정녕 그러한 마음이란 말인가. 어째서?”
김통정의 눈이 동그래졌다. 허공을 향해 초점이 사라진 눈동자는 선명한 빛이 감돌았다. 딱히 그를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다만 내 판단에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점만 전하고 싶을 뿐. 눈에서 힘을 풀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이를 꽉 깨물며 잠재울 수 있었다.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없다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스며들었다. 애써 굵게 목을 가다듬었지만 온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건 조금 전 동굴을 빠져나오면서 생긴 상처뿐. 모든 걸 내려놓지 못 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나보다 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동정이라는 표현 선뜻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얼른 숨겼다. 그나 나나 지금 이 순간,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은 건 사실이니.
어둠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갔다. 어렴풋하지만 바다가 조금씩 빛깔을 내뿜었고, 주변의 오름들도 역시 조금씩 모양새를 드러냈다.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가 가야할 곳으로.
“온전히 갈 수는 있는 것인가?”
장담할 순 없었다. 그러나 방법도 따로 없었다. 일단 움직이고, 몽골군이 아닌 고려군과 먼저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터라, 바닥이 상당히 거칠었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만한 단서도 없었다. 멀리서 내려다봤을 때 바다 쪽이면 좋겠다, 그런 정도였다. 간간이 말발굽 소리가 들려 몸을 피해 보면 모두 몽골군이었다. 심지어 어떤 군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숨은 곳 근처까지 다가왔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고려군 진영이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러다 제풀에 지쳐 쓰러지거나, 저놈들에게 스스로 제물이 되거나.”
물 한 잔도 마실 새 없이 움직이기만 했다. 그의 말처럼 이대로는 한계가 있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민가 몇 채들이 보였다. 아주 큰 마을은 아닐지언정, 물 한 잔 정도 나눌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마을 초입에 들어서기 전 다시 한 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무들로 우거졌고, 또 다른 마을의 존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흔한 산짐승의 굶주린 포효와 산새들의 차가운 지저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마을과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무거웠다. 얼굴이 조금씩 뜨겁게 달아올랐고, 땀도 한 방울씩 흐르기 시작했다.
“왠지 기운이 좋지 않구만.”
그는 숨을 거칠게 내뱉고 있었다. 어지간해서는 지친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터라, 축 처져가는 어깨가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여기서 발길을 돌릴 순 없었다. 고개를 뒤로 돌아보았으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칠흑 같았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마저도 완전히 잿더미처럼 타버린 듯. 과연 왔던 길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있는 마을의 몇몇 집들만 선명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길게 뻗은 나무 기둥이 양쪽에 세워졌다. 검게 칠해 존재가 과연 나무가 맞는지도 궁금했지만 자세히 살펴볼 여력은 없었다. 일단 조금씩 안으로 들어섰다. 점점 더 마을 내부의 형체가 눈앞에 선명해지려고 할 때, 뒤에서 진동이 울렸다. 조금 전 양옆에 세워졌던 기둥이 쓰러져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 그와 나는 멈춰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계속)